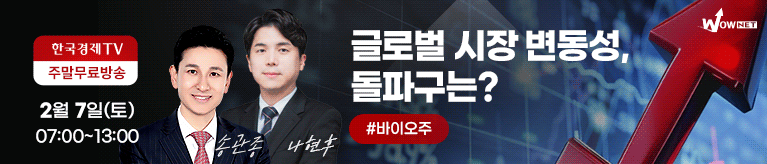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대법원 1996년 11월 22일 선고)
부인이 남편 보험들때 설계사가 대신 서명
보험사 "친필서명 없어 무효… 보험금 못준다"
원고측 "보험료 받아놓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
대법원 "계약시 서면동의는 법에 명시된 규정"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에 붙여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자기나 남이 보험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제 때부터 이 규정이 있었지만 보험 가입 후에 동의해도 되는지, 구두 동의해도 되는지 분쟁이 이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991년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해야 하고, 그 형식은 ‘서면’으로 제한했다.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에 붙여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자기나 남이 보험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제 때부터 이 규정이 있었지만 보험 가입 후에 동의해도 되는지, 구두 동의해도 되는지 분쟁이 이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991년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해야 하고, 그 형식은 ‘서면’으로 제한했다.개정 상법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은 1996년에 나왔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왔다. 그로부터 4반세기, 비슷한 판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보험 계약 건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8300만 건에 이르는 오늘날 이 판결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서면 동의 없는 계약 유무효 공방
1993년 김모씨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내용을 부인에게 설명하고 합의한 후 회사로 돌아와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자필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김씨 이름을 썼다. 1994년 김씨는 위암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보험금을 달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김씨의 친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 부인은 1995년 5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오로지 타인(피보험자)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보험자(보험회사)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반사회적인 주장이거나 금반언(禁反言: 행위자가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는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으므로 꼭 피보험자 보호만을 위한 조항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씨 부인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면 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해야”
대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 법규로서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다. 둘째, 이 조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 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 위험성도 들어 있다. 셋째, 서면 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해야 한다. 그해 연초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꼭 들어맞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나자 언론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했다. 수많은 보험계약자가 당장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다. 남편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생계를 꾸리거나 치료비에 쓸 요량으로 아내가 보험에 가입해 둔 사례가 많았다. 당황한 당시 33개 생명보험회사 사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보험금을 주기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이 결의를 주요 신문 1면에 크게 광고까지 했다. 당시 보험감독원은 서면 동의를 안 한 보험계약자들이 요구할 경우 ‘보험계약 유효확인서’를 발급해주라고 전 보험사에 지시했다. 그러자 사장단 결의에 신문광고까지 했으니 서면 동의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은 신의성실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는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처참한 꼴이 됐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분쟁

1996년 판결은 개정 법조문에 충실한 나무랄 데 없는 판결이다. 그래서인지 한바탕 난리를 겪은 후에 법원은 다시 1996년 판결에 충실히 따랐다. 휴대전화 문자, 태블릿PC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동의 방식이 허용되느냐 하는 것 또한 법조문의 ‘서면’이라는 표현에 걸려 모두 막혔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분쟁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국회의 법 개정, 법원의 유연한 법 해석, 사업자의 철저한 모집관리, 스스로의 계약을 책임 있게 살피는 고객의 의식이 합쳐져야 분쟁을 일부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선정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