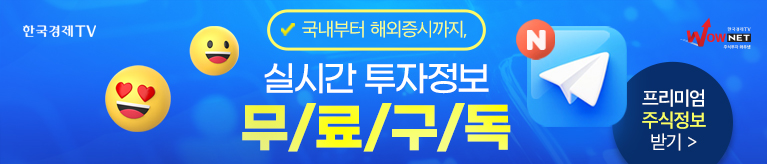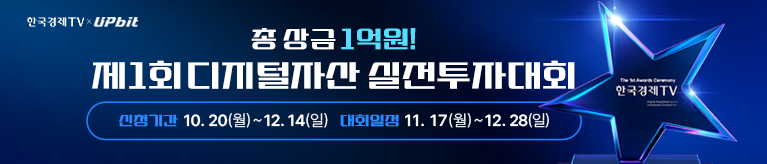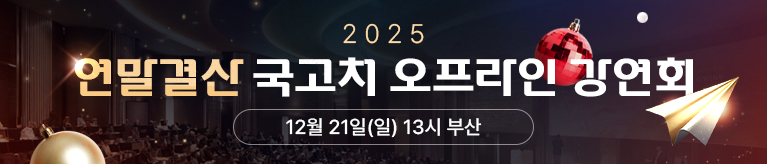차례(茶禮)와 제사(祭祀)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다르다. 차례는 명절을 맞아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예법이다. 이에 비해 제사는 고인의 기일에 맞춰 음식을 바치는 의식으로, ‘기제사(忌祭祀)’를 가리킨다.
차례(茶禮)와 제사(祭祀)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다르다. 차례는 명절을 맞아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예법이다. 이에 비해 제사는 고인의 기일에 맞춰 음식을 바치는 의식으로, ‘기제사(忌祭祀)’를 가리킨다.추석이 다가오자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손길도 빨라지고 있다. 올 추석은 10월4일이다. 음력으로 치면 8월 보름날이다. ‘보름’이란 (음력으로) 그달의 열닷새째 되는 날을 가리킨다. 월인천강지곡(1449)에 ‘보롬’으로 나오니 비교적 형태를 유지한 채 500년 이상을 이어온 셈이다. 명절과 관련한 말들은 조상 대대로 써온 생활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헷갈리고 자주 틀리는 말이 꽤 있다.
염불에선 ‘잿밥’, 제사에선 ‘젯밥’
보름날 중에서도 달이 유난히 크고 둥글게 뜨는 날을 따로 ‘대보름’이라고 했다. 우리말에는 명절로서의 대보름이 두 개 있다. 일반적으로 ‘대보름날’이라고 하면 정월 대보름(음력 1월15일)을 가리킨다. 우리 조상들은 이와 구별해 추석을 ‘팔월대보름’이라 하여 설에 버금가는 명절로 지냈다.
이날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해 차례를 지낸다. 이 차례(茶禮)를 제사(祭祀)와 혼동하는 경우가 꽤 있다. 차례와 제사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다르다. 차례는 명절을 맞아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예법이다. 이에 비해 제사는 고인의 기일에 맞춰 음식을 바치는 의식으로, 정확히는 ‘기제사(忌祭祀)’를 가리킨다. 추석에는 송편을 준비하는 데 비해 제사 때 올리는 밥은 ‘메’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둘 만하다.
‘잿밥’과 ‘젯밥’도 많이 헷갈려하는 말이다. 흔히 ‘염불보다 잿밥’이라고들 한다. 맡은 일은 소홀히 하면서 잇속만 차리려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를 ‘젯밥’으로 쓰는 이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잿밥의 ‘재(齋)’는 가정에서 하는 일반적 제사와 다른 것으로, 불교에서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법회’를 뜻한다. 일종의 ‘불공’인 셈이다. 그러니 잿밥은 불공을 드릴 때 부처 앞에 놓는 밥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젯밥은 ‘제(祭)+밥’의 결합으로 ‘제삿밥’과 같은 말이다. 염불에는 잿밥, 제사에는 젯밥으로 외워두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사십구재(齋)’도 많이 틀리는 단어다. 사십구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를 뜻한다. 이를 달리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한다. 일종의 불교식 제사인데, 어원이 분명한 말이므로 ‘사십구제’라고 쓰지 말아야 한다.
 동그랑땡의 원래 이름은 ‘돈저냐’
동그랑땡의 원래 이름은 ‘돈저냐’추석 차례상 음식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전(煎)’을 빼놓을 수 없다. 토박이말로는 ‘저냐’라고 한다. 기름에 지져 고소한 맛이 일품인 이 저냐 중에는 ‘동그랑땡’이 재미있다. 본래 말은 ‘돈저냐’다. 저냐 모양이 엽전처럼 생긴 데서 붙은 이름이다(두산세계대백과). 1961년 나온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에 ‘돈저냐의 속된 말’로 올라 있으니 동그랑땡이 쓰인 지도 꽤 오래됐다.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에선 동그랑땡을 ‘돈저냐를 달리 이르는 말’로 올렸다. 세월 따라 말의 격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하긴 요즘은 돈저냐는 몰라도 동그랑땡은 알고 있는 이가 많을 것이다.
추석에는 또 집안이 한곳에 모여 웃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우리네 풍습이다. 이럴 때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리라는 의미로 간혹 “세배하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세배(歲拜)란 ‘섣달그믐이나 정초에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절’로, 설 때 드리는 큰절을 따로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추석에는 “큰절 올리거라” 정도가 적당하다. ‘큰절’이란 혼례나 제례 따위의 의식이나 웃어른에게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에서 하는 절을 말한다.
홍성호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