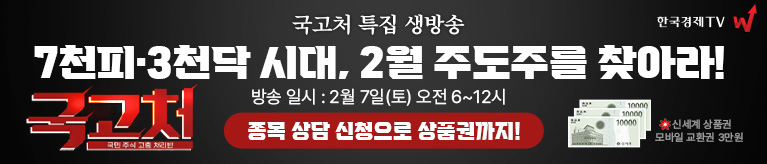이마저 형량도 낮았다. 법원이 자체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6년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어서다. 최대 10~2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핵심 기술 탈취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이 적어 관련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생존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산업 흥망에 영향을 미친다. 유출 시도가 산업부가 지정한 조선, 반도체, 첨단 소재 등 61개 ‘국가핵심기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군사용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있어 유출 시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국가가 첨단 기술 보호를 안보차원에서 다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스파이 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수차례 개정해 기술유출범을 ‘무(無)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형, 추징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56억4000만원)에 이른다. 국외에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영업비밀을 탈취 시도만 해도 처벌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은 피해가 나타나야만 처벌한다.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기소율이 낮고 무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강력한 법만으로는 기술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기업들도 기술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와 인력관리를 선진화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의 81.4%가 퇴직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보안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핵심 기술 탈취를 막을 강력한 법체계 마련과 더불어 기업의 보안강화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