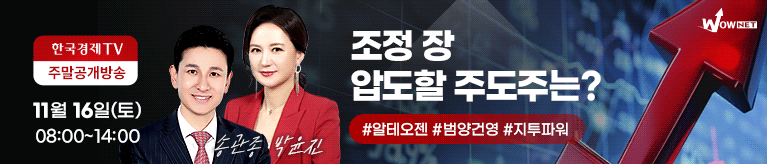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생산이 수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 들어 중국 미국 등 해외 판매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다. 이 와중에도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의 정규직 노조들은 무리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위협을 일삼고 있다. 떨어지는 생산성을 끌어올려 일감을 더 확보하자는 고민은 어느 노조에서도 볼 수 없다.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16만2548대로, 2010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다. 한국의 신차 생산은 지난해 인도에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해 7위로 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 3월 이후 현지 판매가 50% 이상 급감해 비상이 걸렸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협력협정(EPA) 타결도 큰 부담이다.
자동차 노조는 그러나 회사의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몫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7일 파업을 가결한 한국GM 노조를 시작으로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더구나 한국GM은 지난 3년 내내 손실을 냈다. 누적 손실이 2조원에 달하면서 ‘한국 철수설’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현대차 노조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등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 회사 노조는 2000여 대의 버스 주문이 밀려 있는데도 회사의 증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과거 쌍용차 사례를 끌어들일 것까지도 없다. 판매가 줄고 일감이 없어 위기에 빠진 회사에 노조가 파업으로 얻을 것은 없다. 일감이 줄어든 것에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회사와 노조가 함께 망하는 파국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노조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괜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감이 없어지면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이런 판에 상급노조의 ‘정치 파업’에나 열심이라면 노조가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부른다는 비판에 뭐라고 할 것인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