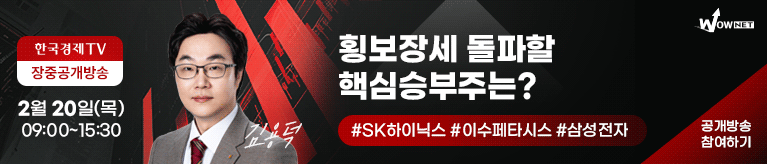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 정리계획’에 국회가 입법으로 개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엊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는 한마디로 은행 지점을 없앨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하자는 논의였다. ‘관치금융’을 털어내자는 수십 년 노력을 무력화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으로 비친다.
토론회의 계기가 된 한국씨티은행의 점포감축안은 1년 이상 준비된 그 나름의 생존전략이다. 은행 거래 중 95%가 인터넷 등 비(非)대면 거래이고, 5%에 그치는 지점망에 직원 40%가 배치된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일 것이다. 이 조치에 따른 인위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은행장의 언론 발표도 있었다. 핀테크는 날로 발달하고, 인터넷전문 은행들은 사활을 걸고 추격하는 은행업계의 치열한 살아남기 경쟁의 한 단면이다. 은행만도 아니다. 공공부문이라면 모를까 이런 경쟁이 없는 곳도 드물다.
126개 점포 중 101개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면 충남·북, 경남, 울산, 제주에는 씨티 점포가 없어져 은행 이용자 간 차별이 생긴다는 게 점포 정리까지 허가사항으로 법제화하자는 ‘신(新)관치론’의 주장이다. 은행 점포는 씨티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4대 은행’의 점포는 수십 배 더 많고 지역은행도 곳곳에 있다. 은행 바꾸기는 장보기만큼이나 쉬워 소비자 불편을 내세운 관치 복귀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결국 점포 폐쇄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낀 노조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주요 국가 중 은행 점포 정리가 정부 손에 달린 곳은 거의 없다. 인터넷뱅킹, 모바일금융이 심화되는 판에 외국계 은행의 점포 유지에 드는 손실을 정부가 부담이라도 할 텐가. 핀테크 시대에 부응해 은행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재래식 점포는 오히려 감축을 유도해야 할 판이다. 은행업 특성상 설사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인정한다 해도 선을 넘은 역주행이다. FTA 위반 논란거리로 비화돼 미국과 통상분쟁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다행히 금융위원회는 ‘법리적으로 불가’라는 입장이다. 노조와 여당이 공조하는 ‘노정(勞政)정치’에 맞서 끝까지 옳은 소리를 낼지 지켜볼 것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