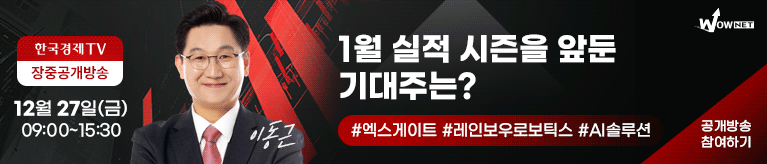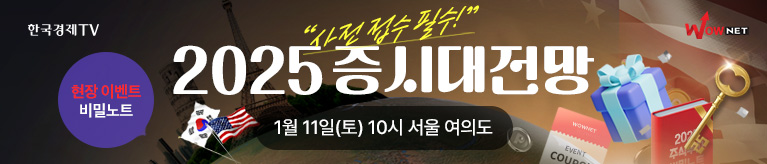우리나라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가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독서량, 건전한 정치 참여, 자원봉사 같은 영역도 중산층 평가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중산층 기준을 알아보자.

이 그래프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이 발행하는 '한경 비탑민' 2016년 12월1일자에 실렸다.
크레디트스위스의 ‘2016 세계 부 보고서(World wealth Report 2016)’를 토대로 미국인터넷 매체인 쿼즈닷컴이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4800만명(성인)을 100명으로 추산했을 때 각 나라에 몇 명 정도 속하는지 보여주는 분포도다. 풀어서 말하면 한국에 100명 중에 1명이 속해 있다면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한국인의 수가 48만명 정도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일본·영국 순으로 많아
이 그래프를 보면 100명으로 환산 시 상위 1%는 미국이 38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일본이 10명, 영국이 7명이다. 또 프랑스 독일 중국이 각 5명,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가 각 4명이고, 스위스와 한국은 각 2명이다. 이들 11개 나라가 100명 중 86명을 차지한다.
뒤이어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대만이 1명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미국이 4명 늘었고 중국은 1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프랑스는 4명, 일본과 이탈리아는 각각 2명 줄었다.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약진한 반면 유럽과 일본은 약세다. 영국 독일 정도만 현상 유지를 했다. 한편 대륙별로는 100명 중 북미가 42명, 유럽이 32명, 아시아태평양이 25명, 남미가 1명이고 아프리카는 없다.
세계 1%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소유한 부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등의 자산을 74만4400달러(약 8억7500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백만장자’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백만장자는 실제 자산이 100만달러(약 11억7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100만달러 이상 자산을 소유할 경우 세계 0.7%에 해당하는 부자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만장자가 67만9000명으로 2015년보다 1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백만장자는 미국이 1355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82만6000명, 영국 222만5000명, 독일 163만7000명 규모였다. 세계 부자 1%의 기준인 8억7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약 1814만명, 일본은 460만명, 한국은 96만명 수준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국이 2010년에 비해 192만명의 부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물론 8억원 이상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8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모두 부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에 전국 성인 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상적인 중산층 수준으로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조사됐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수준이 세계 1% 부자에 근접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세계 1% 부자에 해당하니 꽤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부자다.
중국 백만장자 가장 많이 증가할 듯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는 2021년까지 백만장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까지 282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며 자산 가치는 2015년 대비 80.7% 늘어난 10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이 보고서에는 여러 나라 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2016년 백만장자의 숫자가 159만명이지만 2021년에는 27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룬 놀라운 업적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마도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있는 자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소득과 자산수준으로 따져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마음가짐이나 감성은 객관적 기준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따져볼 뿐이다.
김형진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