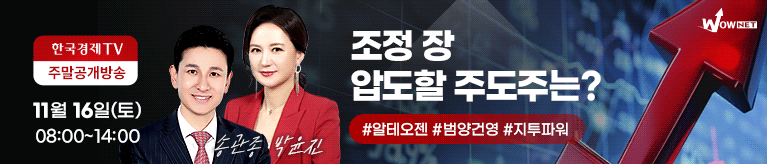대기업 첫 미팅서 "기술 공개" 황당
비밀유지계약 요청엔 차일피일 미뤄
"서로 존중하는 생태계 조성해야"
[ 남윤선 기자 ]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A사는 반도체 관련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기술(IT) 기기를 좀 더 싸게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자 삼성, LG 등 대기업 계열사에서 잇따라 연락이 왔다. A사 대표는 부푼 기대를 안고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몇 차례 미팅 뒤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다. “만나자마자 대뜸 ‘코드부터 공개해보라’고 하더군요. 그게 핵심 기술인데 뭘 믿고 공개합니까.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는 몇 차례 공개했는데 어떻게 협업할지는 얘기하지 않고 계속 기술만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A사는 반도체 관련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기술(IT) 기기를 좀 더 싸게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자 삼성, LG 등 대기업 계열사에서 잇따라 연락이 왔다. A사 대표는 부푼 기대를 안고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몇 차례 미팅 뒤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다. “만나자마자 대뜸 ‘코드부터 공개해보라’고 하더군요. 그게 핵심 기술인데 뭘 믿고 공개합니까.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는 몇 차례 공개했는데 어떻게 협업할지는 얘기하지 않고 계속 기술만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협의를 중단했습니다.”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B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역시 대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회사로 초대했더니 만나자마자 제품부터 뜯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기술을 보고 싶으면 비밀유지협약(NDA)부터 맺자”고 했으나 대기업 측에서는 “결제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기술을 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회신이 없었고 기술 유출을 우려한 스타트업 대표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뒤에야 NDA를 받을 수 있었다. B사 대표는 “이 외에 제품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찾아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보라’거나 ‘우리 회사 가치가 100억원이 넘는데 몇 억원 줄 테니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는 식으로 대기업과는 안 좋은 기억이 많다”고 토로했다.
물론 모든 대기업의 사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나다 보면 비슷한 하소연을 털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풍토에 염증을 느낀 스타트업 중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많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해외 기업은 먼저 자기네 기술을 보여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NDA를 요구하며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도 좋은 제조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세계 최대 전자쇼(CES)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글로벌 전시회에서 뽑은 우수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이 한둘씩은 꼭 끼어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윤선 IT·과학부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