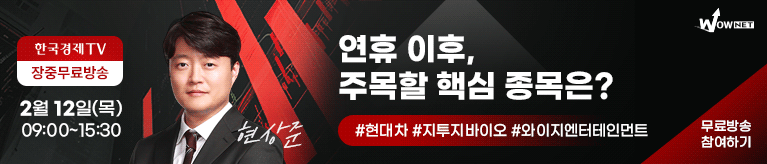지수는 정체되고 순위는 뒷걸음질
감시의무 철저히 해야 윗물 맑아져"
윤용규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달 25일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2014년 11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공공영역(정치권과 정부기관)의 부패 정도를 여러 기구의 ‘인식’자료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 전년보다 3점 낮아진 53점으로 심사대상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심심찮게 터져 나온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의 탈선을 기억한다면 이런 점수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달 25일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2014년 11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공공영역(정치권과 정부기관)의 부패 정도를 여러 기구의 ‘인식’자료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 전년보다 3점 낮아진 53점으로 심사대상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심심찮게 터져 나온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의 탈선을 기억한다면 이런 점수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그런 점에서 한국투명성기구의 반응은 좀 과민한 것 같다. “2015년 37위에서 무려 15계단을 하락해 1995년 부패지수 측정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는 성명은 단순하고 피상적이다. ‘참혹한 결과’ ‘이 참담한 지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같은 표현은 반성이 지나쳐 자기비하로 보인다. 순위나 지수 하락이 유쾌할 리는 없지만 이렇게 당황할 일은 아니다.
순위의 등락은 다른 요인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 37위로 올라간 것은 상위 5개국이 조사에서 빠진 덕을 본 것인 반면, 이번엔 새로 참여한 7개국이 우리보다 청렴도가 높아 하락폭이 좀 더 벌어진 것이다. 이런 변수를 간과한 채 단순히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가장 큰 폭으로’를 강조한 건 겉만 보고 말한 것이다.
지수 하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 이번처럼 다수의 상위 국가들도 내려갔다고 해서가 아니라 평가란 결국 ‘부패방지’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결과를 받아들여 합리적인 반부패활동으로 연결시키면 될 일이다. 점수가 낮아졌다면 정부와 사회에 더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듣도록 해야 한다.
십수년간 정부는 반부패 사정기관의 조직을 강화해 꾸준히 반부패활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근 10년간 부패지수는 정체(54~56)를 보였고 이번에는 떨어졌다. 그간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굵직한 사건들이란 대개 공직부패 사건이다. 지금 줄줄이 수사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반부패전략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들을 그때그때 바르게 처리했다면 국가청렴도는 분명 향상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검찰의 과잉 수사나 기소, 법원의 법왜곡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그들끼리의 부패 고리’ 때문이라고 국민은 믿는데 유독 반부패기관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이름을 바꿔 기구를 거대화한다고 해서 거악을 잡는 것이 아님도 증명됐다. 공공영역의 ‘윗물’은 애써 피하고 국민을 향해서는 추상같이 청렴을 강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력한 자신을 감추려는 위선으로 보인다. 너무 쉽게 법제도 미비를 탓하는 것은 부패의 고리로부터 법이 도망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성명은 말미에 반부패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9개 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매해 반복된 것들로 대부분 새로운 법제도나 기구를 설치하라는 요구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라’고 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현행 법과 제도를 성실히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이 없어서 이런 거악이 판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른바 ‘집행결손’이라는 음지가 없다면 지금의 이 국정농단이라는 독버섯은 자라지 못했다.
물론 전대미문의 위법비리로 자랄 때까지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경찰, 행정부에 설치된 허다한 감사부서의 촘촘한 감시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감독자들이 잠자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충실한 법 집행 없이는 반부패는 물론 법치도 실현될 수 없다. 대상을 분명히 해 감시의무를 다한다면 윗물은 맑아진다. 이를 위한 땀의 무게에 따라 내년 CPI는 최악이 될 수도, 높은 국가청렴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윤용규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