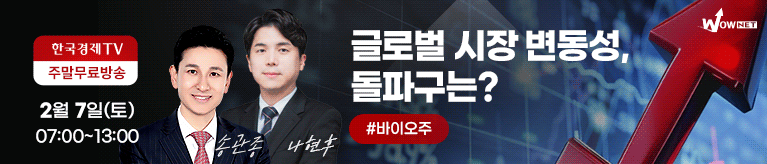[최진석 기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월드랠리챔피언십(WRC) 드라이버가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달려 반드시 메인 무대에 서겠습니다.”
임채원(33)은 한국 사람들에게 다소 낯선 직업을 갖고 있다. 그는 카레이서다. 모터스포츠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위해 경쟁하는 드라이버다. 소수의 마니아들이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지역, 이웃 일본에서도 카레이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성공한 카레이서는 축구, 골프스타 부럽지 않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다. 그는 “현대차가 ‘자동차 경주의 철인 3종 경기’라 불리는 WRC에 참가한 건 나에게 크나큰 행운”이라며 “반드시 프로 드라이버로 성장해 한국에 모터스포츠를 알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채원 선수는 늦깎이 카레이서다.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지만 모터스포츠의 매력을 알게 된 건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 1학년이 마칠 때였다. 그는 “우연히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 경기를 보러 갔다가 레이싱카에 빠져 들었다”며 “이듬해 군 입대 후 자동차 잡지를 탐독하며 자동차와 튜닝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전역 후 임채원은 600만원을 들여 현대차의 스포츠쿠페 투스카니 중고차를 샀다. 그는 “수동 기어를 장착한 전륜구동 차를 타고 도로를 내달렸다”며 “태백에 있는 서킷을 찾아가 달리면서 카레이서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설명했다. ‘레이싱카’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던 그는 무작정 모터스포츠팀 ‘킴스레이싱’을 찾아갔다. 그리고 튜닝한 기아차 프라이드를 타고 아마추어 대회인 ‘금호엑스타’ 대회에서 맛을 봤다. 이후 본격적인 카레이서 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CJ헬로넷슈퍼레이스 1600cc 클래스가 그 무대였다. 그는 당시 7월 일본 오토폴리스 서킷에서 열린 대회 첫 경주에서 깜짝 우승을 거뒀다. 그는 서울대생답게 서킷의 코너 특성을 모조리 암기했다. 덕분에 폭우 속에서도 정교한 주행을 할 수 있었다. 2010년 이 대회 전체 시즌을 3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 그는 모터스포츠 선진국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2011년 일본 ‘슈퍼 포뮬러 주니어’에 참가한 것.

슈퍼 포뮬러 주니어는 포뮬러원(F1) 드라이버를 꿈꾸는 10대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대회다. 포뮬러카는 배기량 1500cc, 14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했다. 출력은 그리 높지 않지만 차량 무게가 400kg로 가벼워 빠른 성능을 갖췄다. 그는 “세계 무대를 가려면 포뮬러 머신을 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서둘러 참가했다”고 말했다.
레이싱 경험이 1년 남짓한 임채원 선수에게 포뮬러카는 낯설었다. 처음 3경기를 하는 동안 그는 사고를 내거나 트랙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는 “얇은 타이어는 도로를 움켜쥐지 못했고 다운포스(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또한 약했다”며 “차량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 해 8월부터는 감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 해에 8월 열린 4번째 경주에서 우승했다. 한국인이 우승하자 주니치 신문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임채원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12년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전체 시즌을 뛰지 못했다. 카레이서는 ‘귀족스포츠’로도 불린다. 자동차라는 비싼 도구를 이용해 경주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는 “슈퍼 포뮬러 주니어를 1년 뛰는데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며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에 항상 비용 부담에 시달렸고, 기업들도 후원을 꺼려 빚을 지면서 카레이서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일본의 F4 웨스트 시리즈 파이널 라운드에 참가해 3위에 올랐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가능성을 확인한 임채원은 2013년 모터스포츠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날아갔다. 유러피언 F3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