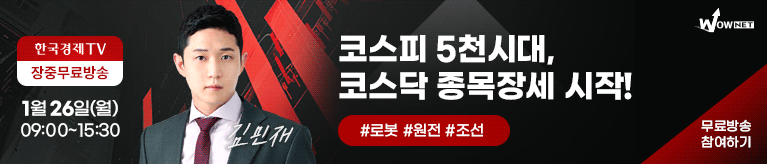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꿈꾸는 유통의 미래
"상품경쟁 시대는 저물어…경험·기억·시간을 잡아야 생존"
[ 김용준/정인설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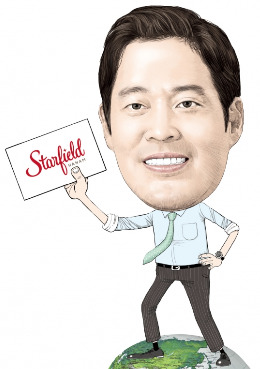 궁금했다. 그가 올린 페이스북 콘텐츠를 볼 때마다 그랬다. 신세계그룹의 리더가 왜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를 만날까. 먹거리 얘기를 올릴 때는 ‘더 멋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까’라는 의문도 가졌다. 스타필드하남 개장을 앞둔 9월 초. 그는 동영상을 하루가 멀다고 올렸다. 그즈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궁금했다. 그가 올린 페이스북 콘텐츠를 볼 때마다 그랬다. 신세계그룹의 리더가 왜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를 만날까. 먹거리 얘기를 올릴 때는 ‘더 멋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까’라는 의문도 가졌다. 스타필드하남 개장을 앞둔 9월 초. 그는 동영상을 하루가 멀다고 올렸다. 그즈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그는 보자마자 “불안하다”고 했다. “오죽 불안하면 페북에 그렇게 열심히 올리겠느냐”며 웃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잠을 잘 못 잔다고 했다. 매일 스타필드를 오가 “살이 6㎏이나 빠졌다”고 했다. 정 부회장의 불안은 성공에 대한 열정과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와 나눈 얘기를 뒤늦게 정리했다. 2016년 유통업계의 트렌드세터인 그를 통해 유통의 미래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마트와 스타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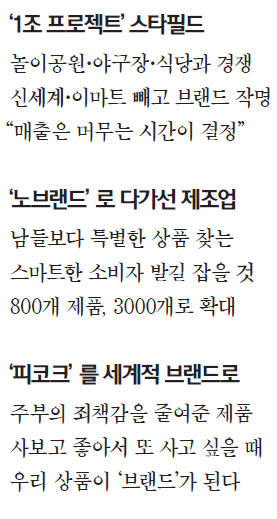 이마트를 시작한 1993년과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이마트는 다음날이라도 접을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마디 덧붙였다. “새로운 사업의 적은 항상 내부에 있더라. 이마트는 문을 여는 당일까지도 반대하는 임원이 있었다.” 스타필드는 달랐다. 그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1조원짜리 프로젝트’였다.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마트를 시작한 1993년과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이마트는 다음날이라도 접을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마디 덧붙였다. “새로운 사업의 적은 항상 내부에 있더라. 이마트는 문을 여는 당일까지도 반대하는 임원이 있었다.” 스타필드는 달랐다. 그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1조원짜리 프로젝트’였다.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다.그가 스타필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유통의 미래”라고 했다. 세계를 다니며 관찰한 결과였다. 그는 “발견한 게 있다”고 했다. “제품을 파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경험 기억 시간이 유통의 핵심 단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험하게 하고, 기억을 남겨줌으로써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미래 유통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타필드의 경쟁자로 “놀이공원, 야구장, 한강공원, 교외식당”을 꼽은 이유다. “매출은 머무는 시간이 가져다준다”는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정 회장은 스타필드로 ‘소환’했다.
청사진도 밝혔다. 스타필드를 전국에 짓겠다고 했다. 그는 “고양은 내년 7월에 연다. 그리고 청라 안성 등에도 스타필드가 들어선다”고 했다. 국민의 시간을 스타필드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었다. 정 회장의 사업 코드를 “시간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이유다.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신세계 이마트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제조업 욕망 “스멀스멀 생긴다”
“제조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마트에서 팔 물건을 직접 만들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예전에 없었는데, 요즘은 스멀스멀 생기고 있다”고 했다. “고객이 이마트에 오는 이유를 생각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상품을 찾으러 오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는 설명이다. 남들보다 특별한, 그리고 트렌디한 상품을 다른 곳보다 먼저 매대에 채우고 싶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려면 탁월한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세계푸드 조직을 강화하고, 이마트 본사에 비밀연구소를 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는 비밀연구소가 있다. 첫 번째 방은 전자레인지 10여대와 식탁이 있는 방이었다. 그곳에서 일일이 출시할 음식을 맛본다. 전자레인지는 데우는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0여대를 가져다 놓았다.
연구개발을 해서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 협력업체를 통해 빠른 스피드로 트렌디한 제품을 내놓는 것. 그의 제조업 모델이다. 옆에 있던 언론계 원로는 “식품업계의 애플이 되고 싶은 거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이마트는 제조업으로 한 발 나아갔다. 자체상표인 피코크와 노브랜드, 센텐스(화장품)가 그것이다. 정 부회장은 노브랜드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무인양품의 초기 정신, 즉 브랜드를 포함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빼고 필요한 것만을 넣어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연필에서 흑연과 나무만 남기면 원가의 70%를 줄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800개인 노브랜드 제품을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찬이 뜨고 있다.
그의 집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대기업 사장실의 반 정도 크기였다. 장식도 없었다. 첼로 모양의 스피커와 책상, 책장에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상품이 진열돼 있었다. 그의 책상을 훔쳐봤다. 메모지에 직접 쓴 문장이 보였다. ‘반찬이 뜨고 있다.’
피코크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피코크는 올해 30% 이상 성장했다. 그는 “피코크는 주부들이 샀다고 얘기 안 하고 만든 것처럼 뻥을 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약간의 조리만으로 가족에게 포장음식을 데워준다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식이라고 했다. “피코크 밑에 함께 넣어 조리할 수 있는 소포장 채소 등을 파는 것도 죄책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피코크의 주요 고객은 싱글이 아니라 “바쁘고 요리를 잘 못 하는 주부”라는 것. 그는 “피코크를 노브랜드와 함께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제주소주 인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주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마시는 게 소주라는 얘기였다.
김용준/정인설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