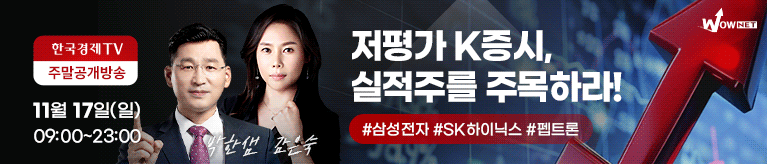4·19 겪으며 법치주의 가치 체득…미국 최대 로펌서 16년간 경영수업
해외 네트워크 넓히는 화우…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할 것
법률가는 공익에 헌신할 책임있어…더 나은 사회 만드는 데 힘써야
[ 김병일 기자 ]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73)는 대표적인 ‘소년 등과’ 케이스다.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4회)에 합격했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27세이던 197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 삼성동 화우 사무실에서 최근 만난 윤 대표는 “4·19 다음해(1961년) 법대에 들어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는 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기에는 버거운 ‘권위주의 시절’이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젊은이는 미국 유학길을 택했다. 선진 법률문화를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판사 생활을 채 1년도 하지 않은 때였다.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73)는 대표적인 ‘소년 등과’ 케이스다.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4회)에 합격했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27세이던 197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 삼성동 화우 사무실에서 최근 만난 윤 대표는 “4·19 다음해(1961년) 법대에 들어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는 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기에는 버거운 ‘권위주의 시절’이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젊은이는 미국 유학길을 택했다. 선진 법률문화를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판사 생활을 채 1년도 하지 않은 때였다.“베이커&맥킨지에서 다 배웠다”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법률 공부가 참 재미있었다”고 유학 시절을 떠올리는 윤 대표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가득 묻어났다.
3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생각이었지만 세계 최대 로펌 베이커&맥킨지가 그의 발길을 잡았다. 잠깐 경험을 쌓을 요량이었는데 16년을 몸담았다. 베이커&맥킨지에서 윤 대표는 로펌 경영 노하우를 비롯해 로펌의 사명과 사회적 기여의 필요성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배웠고, 10년간 파트너로 일하면서 로펌 경영을 배웠다”고 술회했다. ‘윤리적이고 민주적이면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 구상이 여기서 나왔다. 베이커& 맥킨지 초기에는 미국 일, 특히 공정거래 관련 일을 주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로 업무 범위가 넓어졌고, 경제가 고속성장기에 있던 한국 기업들도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두루 잘 아는 변호사”라는 소문이 났고, 로펌 설립을 위한 청사진도 착착 진행됐다.
두 차례 합병으로 덩치 키워
1989년 귀국해 윤 대표가 처음 세운 로펌이 우방이다. 영문 명칭 ‘Yoon & Partners’에서 보듯 우방 설립 때는 사실상 윤 대표 혼자였다. 자신감이 넘쳤다는 얘기다. 이후 김재영, 유인의, 김성식, 백현기 변호사 등이 차례로 합류했다.
창업 14년 만인 2003년 화백과 합쳤다. 노경래 변호사를 대표로 법원 출신 변호사 6인이 주축이 돼 세운 화백은 소송에 강점이 있었다. 화우 영문 명칭 ‘Yoon & Yang’에 성이 나오는 양삼승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이때 가세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 차정일 전 특별검사 등 거물들도 한식구가 됐다. 이로써 화우가 5대 로펌 자리에 우뚝 올라서게 됐다.
2006년에는 김신유와 다시 짝짓기했다. 1967년 김진억 변호사 등이 설립한 김신유는 국내 2호 로펌으로 기업자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윤 대표는 “두 번에 걸친 합병으로 상당히 빨리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하면 변호사업계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이 윤 대표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로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이 로펌에 와야 하기 때문에 로펌은 자연히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윤 대표의 논리다. ‘대형 로펌의 한계’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표는 국내 톱5 로펌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꿈은 세계 유수 로펌과 어깨를 견주는 것이다. 그는 “2~3개 글로벌 로펌이 2030년 이전에 나올 텐데 화우는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화우에는 30개 전문 분야에 변호사를 비롯해 약 360명의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투자, 인수합병(M&A)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 사무소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이어 지난달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소를 연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표는 “법률가는 공익을 위해 살아갈 책임이 있다”며 “우리 법인이 잘되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잘되고, 당장 잘되는 것보다 미래에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