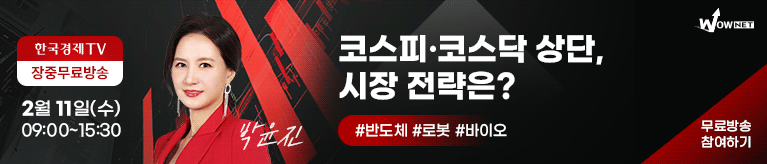얼마 전 큰 이름의 문학상을 연달아 받았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문학적 소양 같은 것이 반짝반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백일장 같은 곳에 나가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엔 초등학교 시절대로 그랬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중고등학교 시절대로 그랬다. 나는 언제나 그런 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다.
얼마 전 큰 이름의 문학상을 연달아 받았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문학적 소양 같은 것이 반짝반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백일장 같은 곳에 나가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엔 초등학교 시절대로 그랬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중고등학교 시절대로 그랬다. 나는 언제나 그런 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다.한 학년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골 초등학교 시절에도 나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빛나는 구석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 앞에는 늘 공부로도, 글짓기로도 앞선 친구들이 있었다. 시나 군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에 나갈 학교 대표를 뽑는 교내 대회에서조차 나는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시골 초등학교의 작은 교내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쩌다 큰 대회에 나가서도 번번이 떨어지기만 하는 나를 믿어주는 한 선생님이 계셨다.
지금은 정년을 마친 지도 오래돼 사모님과 함께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는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다. 나에게만 특별한 인상으로 남는 분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그 선생님 얘기를 한다.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동창들을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오고 있는데, 50명쯤의 졸업생 중 서울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열다섯 명 정도이며, 그중 열 명쯤이 서울 시내의 한 작은 음식점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 멀리서는 울산과 광주에서도 오고, 때로는 강릉의 친구들도 일부러 서울로 올라와 그 모임에 합류하기도 한다.
어디서 만나든 서로 그간의 안부를 주고받은 다음 꼭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 옛 시절 선생님에 대한 얘기다. 친구들끼리 그 선생님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근황과 건강을 묻는 우리 마음속의 은사님이 계신 것이다.
교내 백일장에서는 물론 군 대회같이 큰 백일장에 나가서도 매번 떨어지는 내게 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 그때 군 대회에 나가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다음이어서 어린 마음에도 나는 참으로 큰 낙담을 했었다. 그런 나를 학교 운동장 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저기 서 있는 매화나무는 어떤 나무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란다. 그런 매화나무 중에서도 다른 가지보다 더 일찍 피는 꽃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다른 가지에서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한 가지에서만 일찍 꽃이 피니 반갑고 보기도 좋지. 그렇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선생님이 보기에 어느 나무든 남보다 먼저 핀 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꽃들은 늘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뒤에 피는 거란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 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마다 방법이 달랐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그 선생님에게 그런 사연 하나씩 가지고 있다.
멀리 떨어져 살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 안에 그 선생님은 지금도 환하게 인생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뵀을 때, 선생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두고 있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하셨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한 해가 지나가는 계절, 늘 전화로만 안부를 드렸는데 해가 가기 전에 꼭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순원 < 소설가 >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