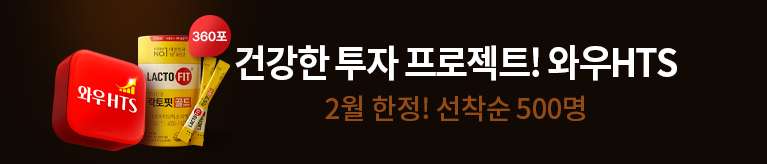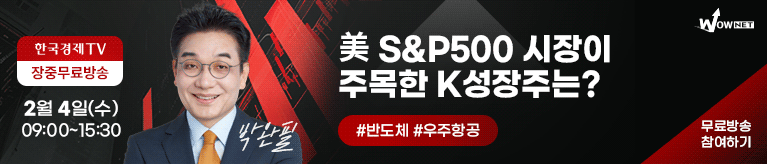리처드 불리엣 지음 / 소슬기 옮김 / MID / 268쪽 / 1만5000원
동유럽 사륜차가 인간 첫 바퀴,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설 반박
마차혁명·철도와 자동차의 경쟁 등 바퀴의 관점으로 인류사 조명
[ 송태형 기자 ]
 현대인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퀴와 함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갓 태어나면 바퀴 달린 아기침대를 타고 신생아실로 가고, 일생을 마치면 바퀴 달린 들것에 실려 영안실로 간다. 그 사이의 삶도 바퀴로 꽉 채워진다. 유모차와 세발자전거를 타고 세상과 만나고, 바퀴 달린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바퀴 달린 이동수단으로 출퇴근하고,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일한다. 바퀴 달린 수레를 끌고 쇼핑하고,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여행을 다닌다.
현대인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퀴와 함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갓 태어나면 바퀴 달린 아기침대를 타고 신생아실로 가고, 일생을 마치면 바퀴 달린 들것에 실려 영안실로 간다. 그 사이의 삶도 바퀴로 꽉 채워진다. 유모차와 세발자전거를 타고 세상과 만나고, 바퀴 달린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바퀴 달린 이동수단으로 출퇴근하고,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일한다. 바퀴 달린 수레를 끌고 쇼핑하고,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여행을 다닌다.‘바퀴가 인류문명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말에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일상 곳곳에 스며있는 바퀴의 효용과 편의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바퀴는 아주 오래전 처음 발명됐을 때부터 유용한 도구로서 ‘인류의 동반자’였다는 믿음이 퍼져 있다. 많은 역사학자가 그렇게 생각했고 주장했다.
 리처드 불리엣 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 교수(76)는 《바퀴, 세계를 굴리다》에서 그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원전 4000년 무렵 등장한 바퀴가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유용한 도구는 아니었다. 바퀴를 알면서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했다가 사장시켰던 문화도 역사상 여럿 존재했다. 바퀴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란 관념이 등장한 것은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바퀴 달린 물건이 생활에 확산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다.
리처드 불리엣 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 교수(76)는 《바퀴, 세계를 굴리다》에서 그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원전 4000년 무렵 등장한 바퀴가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유용한 도구는 아니었다. 바퀴를 알면서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했다가 사장시켰던 문화도 역사상 여럿 존재했다. 바퀴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란 관념이 등장한 것은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바퀴 달린 물건이 생활에 확산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다.저자는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4000년부터 현대까지,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 걸쳐 인류사를 훑으며 바퀴의 거의 모든 역사를 다룬다. 바퀴가 현재의 효용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쳤는지를 경제·문화·정치적 맥락에서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통설들을 반박하며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바퀴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차축 끝에 고정돼 축과 함께 움직이는 ‘윤축’, 차축은 가만히 있고 양 끝에서 제각각 굴러가는 ‘독립차륜’, 유모차나 의자에 달린 ‘캐스터’다. 저자는 바퀴의 기원을 기원전 4000년께 동유럽 카르파티아 산맥 구리광산에서 사용된 윤축에서 찾는다. 청동기 시대에 앞선 동기 시대의 구리 채굴이 바퀴 발명의 어머니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널리 인정되는 고고학자 스튜어트 피곳의 메소포타미아 바퀴 기원설과 배치된다. 피곳은 메소포타미아와 유럽 북서부에서 바퀴를 사용한 가장 초기 흔적이 거의 동시대에서 나왔을 때 메소포타미아를 선택했다. 덜 복잡한 신석기 유럽보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뤄진 복잡한 혁신의 일부로서 최초의 발명품(바퀴)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했다.
저자는 ‘탄소-14 연대 측정법’으로 조정된 연대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바퀴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부 유럽인이 바퀴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발명의 어머니’인 필요성도 구리광산이 더 강했다. 광부들에겐 깊은 탄광에서 캐낸 무거운 구리원석을 입구까지 나를 수단이 절실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바퀴의 사용은 제례나 축제 행렬 등에서 지배자들의 과시용 이동 수단으로 한정됐다.
저자는 이들의 가정에 기본적인 오류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수레를 꼭 동물이 끌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이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끌고 밀었다는 흔적은 풍부하게 남아 있다. 구리광산의 사륜광차는 인간이 밀었다. 19세기 일본에서 발명된 인력거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널리 쓰였다. 이들은 바퀴의 효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바퀴가 해당 지역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무시했다. 저자는 바퀴를 발명해 놓고도 널리 사용하지 않은 문명은 사람이나 가축이 직접 짐을 나르는 기존 방법을 저버릴 만큼 바퀴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은 세계를 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퀴는 역사적으로 정치적·경제적·심리적 요인에 따라 발명되고, 쇠락했으며 재발견됐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저명한 역사학자답게 다양한 근거와 정교한 논리를 통해 바퀴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써내려 간다. 바퀴를 움직인 동물의 힘을 증기기관 등 엔진의 힘이나 인력거·자전거·캐스터를 통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유럽의 16세기 마차혁명이 중국에선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 윤축(철도)과 독립차륜(자동차)의 경쟁이 현대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설명한다. 바퀴의 관점으로 인류의 삶, 발명과 혁신의 역사를 꿰뚫고 통찰한 문명사를 한 권에 담아냈다.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