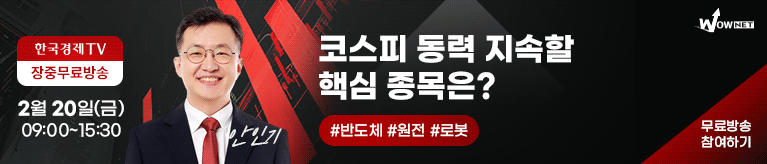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는데도 한국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제품의 GMO 표기 문제로 뒤늦은 혼란을 겪고 있다.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에 GMO표시를 하기로 한 관련법이 올 2월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더 강화된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는데도 한국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제품의 GMO 표기 문제로 뒤늦은 혼란을 겪고 있다.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에 GMO표시를 하기로 한 관련법이 올 2월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더 강화된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GMO는 유전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넣고 빼서 본래의 단점을 없애고 인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한 식품이다.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아프리카 옥수수, 극빈국 아동의 야맹증 치료를 위해 비타민 A를 강화한 황금쌀, 병충해에 강한 콩과 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프랑스 캉대학 연구팀의 ‘암 유발 가능성’ 보고서가 정점이었다. 이후 연구의 표본 부족 등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학술지 게재가 취소됐다. 유럽식품안전국과 140명의 프랑스 과학자들의 비난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인체유해론을 앞세운 그린피스 등의 반대는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지 않자 드디어 노벨상 수상자 120여명이 나섰다. 이들은 최근 “GMO가 인간이나 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한 기존 농산물보다 오히려 덜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세계보건기구, 미국의사협회, 미국과학아카데미, 영국왕립학회, 미국과학진흥협회도 안전성을 확인했다.
영국과 독일 연구팀은 GMO 덕에 농약 사용이 30% 이상 줄었으며 자동차 1000만대 감소와 맞먹는 환경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선 여전히 인체 영향을 알기 위해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농사는 애초부터 자연적이지 않은 일이며,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곡물은 1만여년 전부터 개량되고 변형된 농업혁명의 결과이자 GMO의 역사”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듣지 않는다.
여러 관점에서 보더라도 안전성 논란은 끝났다. 우리 국회에서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유기농 업체가 반대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해도 국회가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외면하고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병 치료에는 유전자 기술이 필요하고 음식에는 안 된다는 논리도 옹색하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