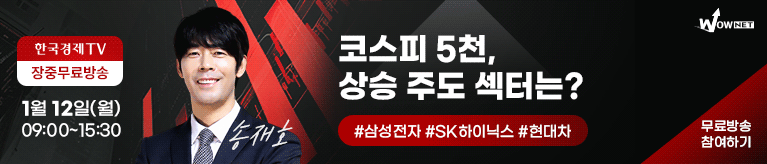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 양병훈 기자 ]
 한국의 밥그릇 용량은 지난 70년간 550㏄에서 260㏄로 반 이상 줄었다. 방바닥에 앉아 밥상에 그릇을 올려놓고 먹던 문화에서 식탁에 앉는 문화로 먹는 모습도 바뀌었다. 중년 세대는 여전히 ‘고봉밥’에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겐 말 자체가 낯설다. 예전에는 가족 행사를 하듯 설레는 마음으로 외식을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집밥’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국의 밥그릇 용량은 지난 70년간 550㏄에서 260㏄로 반 이상 줄었다. 방바닥에 앉아 밥상에 그릇을 올려놓고 먹던 문화에서 식탁에 앉는 문화로 먹는 모습도 바뀌었다. 중년 세대는 여전히 ‘고봉밥’에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겐 말 자체가 낯설다. 예전에는 가족 행사를 하듯 설레는 마음으로 외식을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집밥’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한성우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우리 음식의 언어》에서 ‘음식 언어’를 통해 한국인 식생활의 인문학을 탐구한다. 미국 언어학자 댄 주래프스키가 쓴 《음식의 언어》의 ‘한국 음식판’이다. 밥상에 오른 음식의 이름에 담긴 역사와 삼시세끼를 둘러싼 말들의 다양한 용법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솔직한 풍경을 펼쳐낸다. 저자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말로 표현된다”며 “우리 말로 표현된 그 속에는 우리네 삶의 향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말한다. (한성우 지음, 어크로스, 368쪽, 1만6000원)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