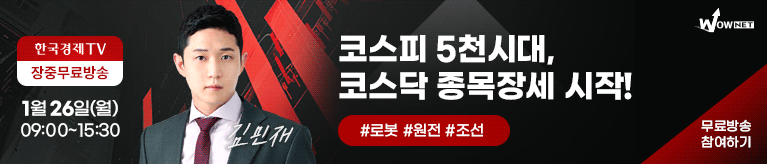사람
지난 달 25일 아침 8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확성기를 든 한 남성이 외쳤다.
“아침부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훈련 '빡세게' 할 테니 준비운동 열심히 합시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인사가 끊이질 않는다. 자원봉사자가 다가서면 시각장애인은 이름을 물었다. 이름을 듣고선 각자의 손을 맞잡았다. 다시 인사하고 반가워했다. 30여 명 중 10여 명은 옆 사람 손을 잡고 경기장 2층 육상 트랙으로 걸었다. 팔짱을 끼고 걷는 이도 있었다.

친구
한 사람은 달리고 싶은 시각장애인, 다른 이는 함께 달릴 자원봉사자. 가이드 러너(Guide Runner)다.
다들 큰 원을 그린 채 준비운동을 시작했다.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구령 소리에 다들 일제히 움직였다. 말로 듣고만 따라 하기 애매한 동작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왔다. 10여 분 준비운동이 끝났다. 시각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두세 명씩 모였다. 각자 달리는 도중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신발과 옷을 다시 확인했다.
시각장애인은 '블라인드 러너(Blind Runner)', 자원봉사자는 '가이드 러너'라고 적힌 쪼기를 입었다.

연결
준비를 마친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서로의 팔을 끈으로 묶었다. 끈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효과적인 장치였다. 끈이 팽팽해지는 촉감을 통해 두 사람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함께 뛴 이들도, 처음 발을 맞추는 이들도 연결 끈에 의지한 채 출발 장소로 이동했다.
올해 4월부터 훈련 12회차를 맞는 이날, 다들 익숙한 듯 20여 분을 편하게 워밍업으로 달려나갔다. 준비운동 때부터 확성기를 든 남성이 트랙 옆에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훈련을 주관하는 러닝 커뮤니티 ‘에프터선셋’ 운영자 김용준 씨(29).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뛰는 이유를 물었다.
도움
“우연히 시각장애인 마라톤 협회와 연이 닿았는데 처음엔 적극적으로 못 도왔었어요. 근데 서울 남산에서 시각장애인 분과 한 번 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앞이 안 보이면 한 걸음 딛기가 두려운데, 장애인 분이 순전히 저를 믿고 달렸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을 나누고 싶어 재능 기부를 시작했어요."
20여 명 자원봉사자, 가이드 러너가 결성된 이유다. 용준 씨처럼 혼자 뛸 때 느끼지 못 했던 감정을 다시 다른 이들과 나누려했다. 56살 가이드러너 김선태 씨도 그랬다. 18년째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이유기도 했다. 한 시각장애인 부탁으로 10월 전국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 동반주자로 출전한다.
“장애인 분이 편하게 뛰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회에서 동반주자가 선수보다 앞에 나서면 실격이에요. 앞에서 끌었다 보는 거죠. 전 선수가 달리는 거 외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도울 뿐이죠.”

선태 씨는 지난해 체전에서 서울 대표로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3관왕을 달성한 베테랑 동반주자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전국에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만나 소주도 한잔하고 사는 얘기도 하지요. 메달을 따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얻는 게 더 좋아요. 요즘 잘 뛰시는 일반인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개인 기록 향상도 좋지만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뛰면 분명 새롭게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자유
쉬는 시간. 모두 숨을 고르며 천천히 물을 마셨다. 시각장애인 선수들도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물을 마셨다. 물 2통이 금세 동났다. 5분 쉬는 시간동안 자세, 호흡 조언을 주고 받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장애라는 장벽이 아닌 함께 달리는 자유였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100미터 단거리 훈련이 이어졌다. 자신이 낼 수 있는 80% 힘으로 100미터 구간을 30회 반복했다. 보기만 해도 힘든 훈련이지만 걷는 이 없이 다들 묵묵히 뛰었다.
1시간가량 훈련이 끝나자 거친 숨소리가 트랙을 채웠다. 삼삼오오 모여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주고 받았다.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던 시각장애인 이기호 씨(64)를 만났다.
“작년까지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직과 동시에 마라톤에 빠졌습니다. 다음 달 체전에 나가고 싶은데 60세가 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11월에 있을 전국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합니다.”
바람
이 날 그는 40살 가까이 차이나는 젊은 자원봉사자와 발을 맞추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다. 100미터 훈련 때는 후반부에 갈수록 페이스가 느려졌지만 걷거나 멈추지 않고 뛰었다. 전력으로 뛰는 순간, 그에게 나이와 장애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이 날 훈련 소감을 그에게 물었다.
“저는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맹입니다. 동반주자로 달려주는 자원봉사자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밖에서 혼자 뛸 수가 없어요. 뛰고 싶으면 집에서 러닝머신을 두 팔로 붙잡고 뛰는 게 다예요. 여기서는 끈 하나면 두 손이 자유로워져요. 밖에서는 불어오는 바람도 느껴지고요. 오늘 훈련은 아�?힘들어 혼났어요. 그래도 뛰고 나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옆자리에 앉은 부인 나찬남 씨(60)도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 날 훈련 동안 벤치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다.
“남편이 퇴직 후 활동량이 많이 줄어 걱정했어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건강한 취미가 생겨 좋죠.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밖에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같이 뛰고 싶은데 못하니깐. 같이 달려줄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어 고맙죠.”
장벽
시각장애인 달리기 환경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저희가 집이 인천인데 달리기 위해 서울까지 와야 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취미 활동을 방 안에서만 하고 싶지는 않죠. 가이드러너가 전국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기호 씨에게 함께 달리는 매력을 물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만 갇혀있을 필요는 없어요. 도전정신을 가지고 일반인과 뒤섞였으면 좋겠어요. 달리다 보면 낚시할 때 입질이 오듯 끈이 팽팽해져요. 누군가 나와 함께 달린다는 위안도 받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기자님도 눈 감고 달리면 두려울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항상 눈앞에 큰 장벽이 서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쉼 없이 달리다 보면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이 이런 게 아닐까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1일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다. 같은 곳에서 먼저 열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의 폐막 뒤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의 감동은 브라질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1일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다. 같은 곳에서 먼저 열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의 폐막 뒤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의 감동은 브라질에만 있는 건 아니다.
책임= 김민성, 연구= 이재근 한경닷컴 기자 rot0115@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