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을 모르는 해운국가의 비극"
정규재 주필
 대한민국의 제1호 국영기업은 대한해운공사였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운명적이었다. 1949년에 설립됐다. 1968년에 민영화됐고 1980년엔 대한선주로 간판을 바꾸었다. 1984년의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를 거쳐 대한상선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가 결국 한진해운에 합병됐다. 그리고 지난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한해운공사의 역사는 한국 해운업의 역사요 부침이요 비극이다. 해운산업은 주기적으로 합리화 즉, 구조조정에 올랐다.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었다. 5위 해운국이라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도 해운업은 언제나 서자였다. 비극은 세월호 하나가 아니었던 거다.
대한민국의 제1호 국영기업은 대한해운공사였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운명적이었다. 1949년에 설립됐다. 1968년에 민영화됐고 1980년엔 대한선주로 간판을 바꾸었다. 1984년의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를 거쳐 대한상선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가 결국 한진해운에 합병됐다. 그리고 지난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한해운공사의 역사는 한국 해운업의 역사요 부침이요 비극이다. 해운산업은 주기적으로 합리화 즉, 구조조정에 올랐다.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었다. 5위 해운국이라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도 해운업은 언제나 서자였다. 비극은 세월호 하나가 아니었던 거다.해양수산부도 부침이 심했다. 처음엔 수산청이었다. 1976년엔 항만청이 설립됐다. 1996년 수산청과 항만청이 통합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됐다. 2008년 해수부가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그러나 2015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이어 엉뚱하게도 해양경찰청이 해체됐다. 한국의 해운업과 해운정책은 해양국가라는 정향에 어울리지 않게도 심하게 뱃멀미를 하고 있다.
물론 한진해운이 망한다고 1조달러 무역 물�弼?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항만에서의 혼란도 곧 질서를 찾을 것이다. 바다의 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4000억원짜리 롱비치 포트가 옮겨가는 것도 아니다. 운임이 올랐다지만 일시적 충격이다. 세계 선복량은 여전히 과잉이고, 때문에 화주 측 시장주도권이 해운사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그런 면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불러온 단기적 물류 쇼크가 이번 사태를 평가하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7년여의 기간을 허송세월한 한진해운 대주주, 거꾸로 달려간 최고경영자(CEO), 부패한 일부 임직원, 해수부의 무뇌적 상태, 한가한 산업은행, 밑그림도 없었던 금융위원회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들은 협심해서 해운산업을 좌초시켰다. 무지도 때로 죄책 사유가 된다는 점은 세월호와 같다. 해수부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둘 다 살릴 수 있거나,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채권단을 설득하려고 했다. 업자와의 어리석은 유착으로 보였다. 해운정책이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언론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해수부는 지난 주말 어촌마을 발전 계획 수준인 몇 건의 보도자료를 다급하게 만들어 냈다. 그게 해양정책의 민낯이다. 채권단이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중 해운을 선택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돼 있었다. 해운은 산업이지만 근로자가 많은 조선은 정치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에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물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해운을 버리는 것이다.
해운업의 파국은 2008년 10월 유럽연합(EU)이 극동운임동맹(FEFC)을 해체할 때 이미 예고됐다. ‘운임동맹도 독점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결정은 해운업을 극심한 단가 경쟁으로 몰아갔다. 해상 운임동맹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극동이었다. 서구 선박들이 극동으로 몰려들자 운임이 폭락했다. 1879년에 창설된 전통의 운임동맹이 130년 만에 무너졌다. 물론 대불황은 그 직전의 해운업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과잉투자의 반작용이었다. 한진해운은 운임이 지옥으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더 많은 선박을 용선하는 거꾸로 베팅을 시도했다. 우리 기억에만도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 이후 해운업은 주기적으로 파도의 골짜기로 곤두박질쳤다.
어떤 이는 미국에도 국적선사가 없다고 말한다. 시랜드(Sea land), APL등 유수 컨테이너 선사조차 머스크(Maersk) 등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륙물류가 없는 한국이 미국을 흉내낼 수 없다. 현대상선 1사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도 NYK, MOL, K-Line 3사 체제를 유지한다. 중국은 COSCO, CSCL을 통합한 초대형 선사다. 컨테이너 시장은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CGM(프랑스)이 3위까지 장악했다. 그래서 EU의 운임동맹 철폐가 유럽의 음모요 기획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무질서한 퇴각은 누가 뭐라든 결국은 무지가 초래한 것이다. 아, 바다를 모르는 해양국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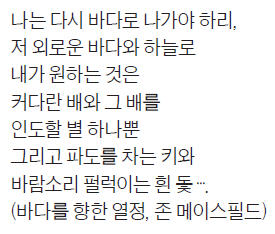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