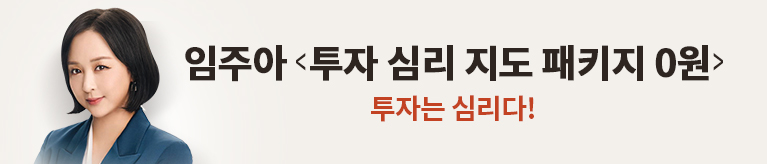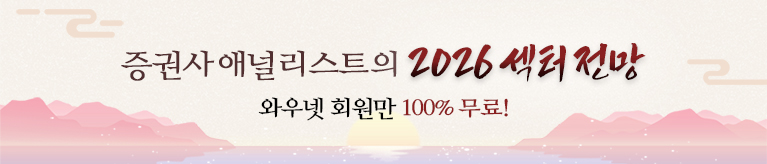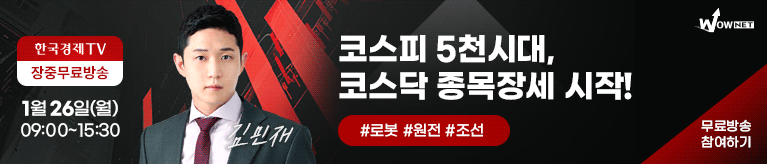허버트 조지 웰스가 소설 《타임머신》을 발표한 것은 1895년이었다. 타임머신은 시간을 여행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그린,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던 작품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독일이 장차 군국주의로 바뀌고 유럽연합(EU)이 만들어지며 도시민들은 도심에서 교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독일이 군국주의로 향해 갈 것이라든가, EU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예상은 빗나갔다. 그의 예언자적 기질은 《투명인간》이나 《우주전쟁》 등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웰스는 스스로를 최초의 미래학자로 불렀다. 웰스의 성공 이후 공상과학 소설들은 잇달아 인기를 끌었다. 쥘 베른의 《해저2만리》나 에드워드 벨라미의 《돌이켜 보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소설 《타임머신》을 발표한 것은 1895년이었다. 타임머신은 시간을 여행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그린,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던 작품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독일이 장차 군국주의로 바뀌고 유럽연합(EU)이 만들어지며 도시민들은 도심에서 교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독일이 군국주의로 향해 갈 것이라든가, EU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예상은 빗나갔다. 그의 예언자적 기질은 《투명인간》이나 《우주전쟁》 등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웰스는 스스로를 최초의 미래학자로 불렀다. 웰스의 성공 이후 공상과학 소설들은 잇달아 인기를 끌었다. 쥘 베른의 《해저2만리》나 에드워드 벨라미의 《돌이켜 보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학문적으로 미래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시작됐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나 SRI연구소 등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시나리오 기법 등 각종 연구방법론이 등장했다. 1950년대 이후엔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학자가 허만 칸 박사다. 군사전략가인 그는 1967년에 2000년의 미래를 묘사한 《서기 2000년》을 내놓으면서 유명해졌다. 칸은 2000년에는 인간 수명이 150세를 넘고 실험실에서 동식물을 제조할 수 있으며 혹성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니얼 벨은 1960년에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집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3의 물결》로 미래학의 한 획을 그은 학자는 앨빈 토플러다. 그는 기계수리와 용접공으로 5년간 일했고 신문기자로 포천과 플레이보이지에 글을 쓰기도 했다. IBM과 제록스, AT&T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사회과학적 방법보다 직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했다. 토플러에 이어 《메가트렌드》(1980)의 존 나이스비트, 《강대국의 흥망》(1989)의 폴 케네디, 《노동의 종말》을 쓴 제러미 리프킨 등도 분석에 기반을 둔 미래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토플러가 87세로 영면했다. 경제학자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가 산업 현장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 인사이트들은 시대를 이끌었다. 그가 예언한 유전자 복제나 PC, 프로슈머의 출현, 재택근무 등 모든 게 현실화하고 있다. 시대적 예언자임에 틀림없다. 토플러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한국에 소개됐다. 자주 다녀가기도 했다. 인구종말론이 횡행하고 4차 산업혁명이 예고되는 시대다. 그의 한 수 지도가 그리워지는 요즈음이다.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