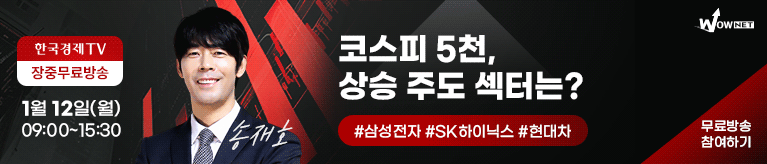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엊그제 대전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과학기술 논문의 영향력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15%로 이스라엘(4.2%)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논문 영향력은 호주 스페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다는 것이다. 외국인 전문가에 비친 한국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다. 충분히 예상한 내용이기도 하다.
한국만큼 단기간에 국가 R&D 투자가 급증한 나라도 없다. 2002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4조12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7조7428억원으로 급증했다. 13년 만에 무려 13조원가량이 늘어났다. 10조원을 넘어선 지가 9년 전이다. 하지만 투자에 비해 연구 성과가 너무 미약하다. 깜짝 놀랄 만한 개발도 보이지 않는다. 사업화로 연결되는 연구성과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해외 과학기술협력조차 여전히 바닥수준이다.
과학기술계는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개발 정책을 지적한다. 논문만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다. 양적인 평가에 급급해 수준 높은 연구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수월성과 일찌감치 담을 쌓은 교육정책도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얘기다. 하지만 연구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로의존성에 갇혀 혁신하지 못하는 과학계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
R&D에 17조원을 쓰면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역량과 인프라다. 과학기술이 물량 공세에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교수도 정부 지원금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자금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 사회의 총제적인 지식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 과학기술계의 자성과 분발이 필요하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