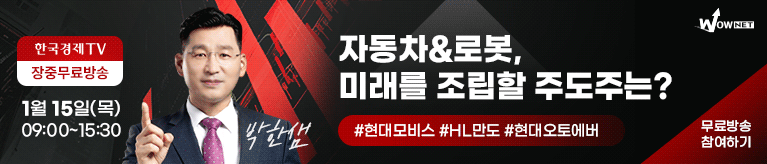정부, 노동력 보충에만 초점
전문인력 유입은 정체…교수·유학생도 정착 어려워
[ 임근호 기자 ]
 한국 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외 유학생 등 포함)은 지난 8월 기준 182만명으로 1년 전보다 6.5% 늘었다. 한국 전체 인구(5147만명)의 약 3.5%에 해당한다.
한국 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외 유학생 등 포함)은 지난 8월 기준 182만명으로 1년 전보다 6.5% 늘었다. 한국 전체 인구(5147만명)의 약 3.5%에 해당한다.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한국 체류 외국인이 약 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인 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은 옛날 산업연수생 제도(1993~2007년)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갈수록 단순기능인력만 늘고 전문인력 유입이 정체되면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기준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64만명 중 단순기능인력은 59만명인 데 비해 전문인력은 5만명에 그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1993년 시작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2007년에 고용허가제로 통합했다. 200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수립했다.
외국의 우수 학생을 많이 받아들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재로 양성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유학생이 한국인과 교류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 편이다.
고용허가제도 기피업종에 대한 노동력 보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3년의 취업기간이 끝나면 대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 3년도 한국인과 사실상 격리된 채 단순노동만 하다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섞일 기회가 많지 않다.
대학·기업이 어렵게 데려온 외국인 교수나 연구자들도 언어 장벽과 경직된 문화,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한국을 금방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비자발급과 체류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사이언스 카드’,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해외우수인력을 발굴하는 ‘콘택트 코리아’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