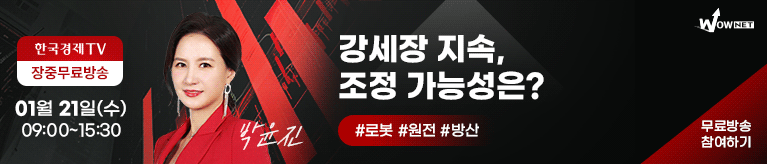지금 북한이 목함지뢰에 이어 포격 도발까지 해와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 때다. 북의 김정은은 포격을 부인하며 준(準)전시상태 선포, 군 완전무장 명령 등으로 긴장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북측이 대북 선전용 확성기를 조준사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모호한 태도다. 어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주한 중국대사도 한 행사에서 질의답변 방식으로 “남북 모두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어정쩡한 대북자세가 북에 도발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안화 평가절하 쇼크, 해외자본의 신흥국 이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등 세계 경제가 뒤숭숭하다. 주요국 정상들마다 ‘환율외교’ ‘경제외교’에 골몰하고 있다. 세계의 관심은 대미(對美)관계 강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9월 말 방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미·러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경착륙이 우려되고,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에다 루블화 추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미국의 동의와 배려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 절하에 대해 미리 미국의 양해를 구했을 정도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박 대통령이 방중한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동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왜 가야 하느냐’는 비판이 여전하다. 더구나 한반도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는 외교적 레토릭일 뿐, 불편해하는 정황은 곳곳에서 읽힌다. 북의 도발에 맞서 미국이 국방을 지켜주는 마당이다.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방중이 돼서는 안 된다.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이 ‘영수증’이 될 수는 없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 결속을 다져야 할 시기다. 중국도 대북자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중국행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옳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