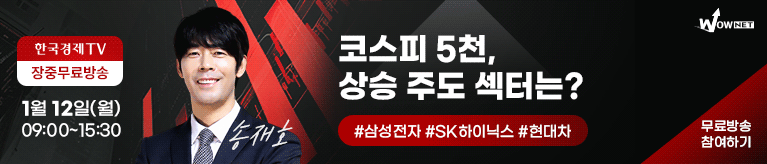마이너스 성장 벗어났지만 긴축 고통·실업률 치솟아
시리자 '벼랑끝 전략' 고수
[ 박종서 기자 ]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것은 2009년 이후 세 번째다.
첫 번째 위기는 2009년 10월 당시 게오르게 프로보풀로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6%)을 뛰어넘는 10%에 달하고 그해 12.5%를 넘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그해 말 일제히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고, 국채금리가 급등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EU와 IMF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공무원 급여 동결, 연료세 인상, 연금 개혁 등의 긴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1100억유로 지원을 결정했다.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그리스 정부와 민간회사 등에 빌려준 돈이 약 2700억유로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돈을 갚지 못해 민간 은행들이 무너지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타격을 입고 EU 경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1100억유로를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유럽 경제 전반이 부진해 그리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그리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졌다.
2011년 성장률은 -8.9%로 곤두박질쳤다. 그리스의 경제상황이 악화돼 또다시 부채를 갚기 어려워지면서 2012년 유럽중앙은행(ECB)과 EU, IMF는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결정했다. 당시 160%에 이르렀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2020년까지 120.5%로 낮추고, 최저임금을 22% 삭감하고, 한 달 연금액이 1300유로 이상인 연금 수령자 수를 12% 줄이는 등의 조건이었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그리스 부채 2060억유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50억유로를 탕감해줬다. 나머지는 그리스 장기국채와 EU가 발행한 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2012년 3월 치러진 총선거에서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2당(71석)으로 부상했지만 여당인 신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이행조건에 따라 개혁조치들을 시행했고, 1차 구제금융을 받은 지 4년 만인 지난해 4월 5년 만기 국채 30억유로어치를 발행하며 국제 채권시장에 복귀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플러스(1.1%)로 돌아섰다. 부채는 줄고 경제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긴축정책의 여파로 실업률은 높아졌다.
긴축에 따른 그리스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선 시리자가 신민당을 누르고 집권했다. 시리자는 또다시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시리자 당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총리가 됐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총선 결과에 대해 “2011년 17.9%였던 실업률이 긴축정책으로 지난해 26.6%까지 치솟고, 청년실업률은 40%에 육박하자 그리스인들의 채권단에 대한 분노가 커졌고, 이 때문에 시리자의 구제금융 재협상 공약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시리자는 그러나 재협상을 통해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기는커녕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말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채권단은 추가 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는 빚부터 탕감해달라고 맞서고 있다”며 “누구도 디폴트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원하지 않지만 양쪽 모두 벼랑 끝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세 번째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