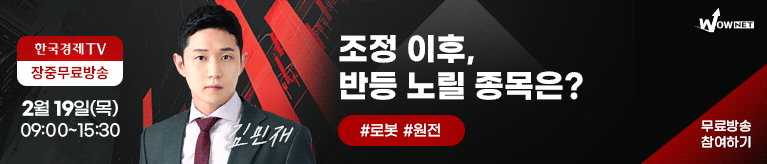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추진했던 재정확대 등 경기 부양책과 8월,10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약발이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전통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주택기금, 중기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지원규모를 늘렸지만 소진율은 부진했다. 돈을 풀어도 가져다 쓰려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경기 부양책이 백약이 무효가 된 데는 글로벌 경기 부진, 저물가, 엔저, 저금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 -1.9%, 2분기 1.1%, 3분기 -0.5% 등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4분기에는 5.6%로 ‘깜짝 호조’를 보였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반기업 정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만연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움츠러드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기업유보금 과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에서 한국이 120개국 중 32위에 그쳐 콜롬비아 라트비아보다 뒤진 것도 열악한 기업 여건과 무관치 않다. 경제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건 기업이다. 경기회복의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모든 기업을 부자로 간주, ‘법인세 인상=부자감세 철회’라는 식의 주장이 계속되는 한, 경기회복은 요원할 뿐이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