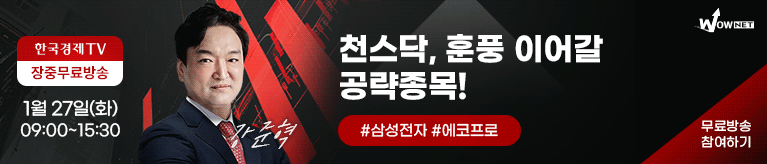서울서 가장 먼 곳은? 부산이나 목포가 아니다. 시간과 접근성을 감안하면 울진 삼척 영덕 쪽이다. 그만큼 오지다. 지역특화라고 할 만한 변변한 산업도 없는 낙후 지역이다. 1970년대 말 9만7000명이던 울진군은 90년대 초 7만명 선으로 줄더니 지금은 5만3000명이다. 주민은 계속 줄고, 대게 오징어 잡이도 전만 못하다. 인구 5만명 사수가 군정(郡政)의 핵심이다. 그런 울진이 대박을 냈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삼척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열흘 전 울진의 선택은 더 빛났다.
서울서 가장 먼 곳은? 부산이나 목포가 아니다. 시간과 접근성을 감안하면 울진 삼척 영덕 쪽이다. 그만큼 오지다. 지역특화라고 할 만한 변변한 산업도 없는 낙후 지역이다. 1970년대 말 9만7000명이던 울진군은 90년대 초 7만명 선으로 줄더니 지금은 5만3000명이다. 주민은 계속 줄고, 대게 오징어 잡이도 전만 못하다. 인구 5만명 사수가 군정(郡政)의 핵심이다. 그런 울진이 대박을 냈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삼척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열흘 전 울진의 선택은 더 빛났다.국책사업인 원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수용한 것은 백번 남는 장사다. 당장 2800억원을 지원받는다. 매년 260억원씩 지원금은 별도다. 이 돈으로 상수도를 늘리고, 자사고와 종합체육관을 짓는다. 관동명승 망양정에 바로 닿는 교량까지 8대 숙원사업을 펼친다. ‘울진사람들 깨어 있네!’ 전국의 찬사와 감사는 돈 차원을 넘어선다.
'원전산업 인식' '선동에 휘둘려'
울진의 원전 수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외부 간섭꾼들 개입을 차단한 것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율행정은 단지 중앙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나자는 게 아니었다. 지방의 구악 정치꾼들, 시민단체라는 온갖 간섭족들의 관여와 훈수 차단이 더 중요해진 시대다. 밀양 송전탑 건설 때 생생히 봤던 일이다. 울진은 그런 자치의 원칙을 지켜냈다. 주민들이 실리실용을 추구하며 지역경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많은 시·군이 배울 점이다. 울진은 맞붙은 영덕보다 주민이 1만3000명 많다.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이 유입한 인구 때문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지역언론을 보면 군청, 군의회 같은 지역의 리더십이 ‘원전산업’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선택도 나왔다.
바로 북쪽의 삼척은 이런 울진을 어떻게 바라볼까. 삼척시는 이미 결론난 원전 건설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섰다. 삼척원전은 4년 전 전임 시장이 유치 신청을 했고 시의회도 동의했다. 2년 전 정부가 근덕면에 부지를 지정고시하는 등 절차도 끝났다. 그런데 새 시장은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희한한 이 반대투표에 18개 정치·사회단체가 지지성명을 냈고 주민들은 따라갔다.
프로 간섭꾼 배제, 자치의 요체
지원금 얼마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도 걷어차고 삼척주민 7만3000명은 무엇에 기대 지역발전을 도모할까. 푸른 동해만 외치고 ‘원전공포’라는 반핵가들 구호에 동조만 해도 이 인구가 유지될까. 중앙에 어떤 지원도 요청 않고 자치를 잘해낼까. 지방선거 때 선동주의와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두고두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도 스무 살, 성년이다. 어느 새 민선 6기다. 하지만 자치의 본질을 모르는 촌사람들이 많다. 시골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촌락공동체적 닫힌 사고에 매몰된 이들이 이 시대의 촌사람들이다. 지방에서도 도시화의 의미나 산업화가 어떤 발전을 가져다주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기업과 산업을 유치한 평택 당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파주·경기도가 연합해 구미가 총본산이던 LG의 디스플레이공장을 어떻게 쟁탈했나. 안 가본 군수라면 지금이라도 임진강 남쪽 상전벽해의 LGD공장을 가봐야 한다. 산업유치 전쟁을 불사해도 버틸까 말까 한 지역경쟁 시대에 굴러드는 호박을 걷어차는 막무가내 지자체를 어떻게 하나.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