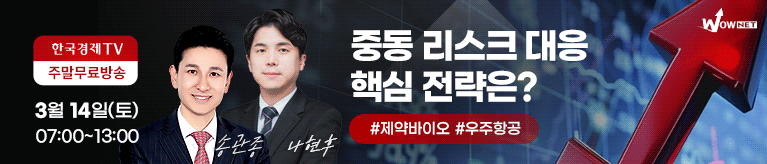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 본토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880년대 말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 도시의 공장 노동자에게 공급할 쌀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쌀값이 폭등하였다. 급기야 1918년에는 쌀값 인하를 요구하는 ‘쌀소동’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쌀과 같은 자포니카 계통인 조선 쌀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엔화 통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수지 악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 본토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880년대 말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 도시의 공장 노동자에게 공급할 쌀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쌀값이 폭등하였다. 급기야 1918년에는 쌀값 인하를 요구하는 ‘쌀소동’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쌀과 같은 자포니카 계통인 조선 쌀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엔화 통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수지 악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조선은 일본 쌀 생산기지로
조선 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 본토에 쌀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므로 밭농사는 경시되고 논농사가 장려되었다. 1910년대는 다수확 품종인 일본 볍씨를 ‘우량품종’이라고 보급하는 정도였지만, 1920년대에는 ‘산미(産米) 증식계획’을 수립해 저수지 수로와 같은 관개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이 일본 대장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후 지주와 농민들로 조직된 수리조합에 이자를 받고 제공되었다. 수리조합은 조합비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관개 면적을 1920년 3만2000여정보에서 1935년 22만6000여정보로 크게 늘렸다(1정보=3천평=9917㎡).
하지만 전체 관개 답에서 수리조합의 관개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에도 20%에 불과했다는 점은 흥미롭다(그림).
같은 기간 관개답이 34만여정보에서 116만여정보로 크게 증가해 전체 논에서 관개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22.1%에서 68.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증가한 관개답의 대부분은 수리조합이 아닌 일반 지주·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수리조합도 산미 증식계획 초기에는 일본인 지주가 중심이 된 대규모 수리조합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인에 의한 소규모 수리조합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총독부의 산미 증식계획은 그러나 1930년 이후 주춤해졌다. 농업 불황으로 일본 본토의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1934년부터 관개시설 건설이 중단되고 대신 우량품종 보급과 비료 투입 증대 정책이 시행되었다. 흥남의 조선질소 비료공장 완공은 비료 사용량 증가의 계기가 되었다.
관개시설의 확충과 품종 개량 및 비료 투입 증가로 쌀 생산은 기복이 있지만 1920년 1440만석에서 1930년 2183만석, 1937년 최고 2680만석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증가한 쌀은 대부분 일본으로 판매돼 국내 소비량은 별로 늘지 않았다. 1916~1920년에는 쌀 생산량의 15.7%가 이출되었는데, 1931~1935년에는 49.3%나 이출되었던 것이다(소량의 수출 포함).
쌀 이출을 주도한 것은 지주였다. 일반 농민들은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작농이라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쌀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주들은 소작료로 거둔 쌀의 대부분을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30~1933년에 지주는 1호당 62.3석을 취득하였지만 자작농은 5.4석, 소작농은 겨우 2.2석을 손에 쥘 수 있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시대 지주제는 한마디로 말해 일본으로 쌀을 이출하기 위한 농업 제도였다. 만일 지주제가 해체돼 지주가 소작농으로부터 소작미를 거둘 수 없게 된다면 대부분의 쌀은 농민들의 자급용으로 소비되어 일본 이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주제 발달로 농민 80%가 소작농
식민지 시기의 경제를 해방 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지주제가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지주로부터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지는 토지조사사업이 끝나는 1918년에는 전체 경지 중 50.4%였으나 1942년에는 58.3%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소작농가도 37.8%에서 53.8%로 급증했다. 소작농에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자소작농’을 더하면 거의 80%에 달해 식민지 시대 대부분 농민은 소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소작료는 조선시대에 이미 ‘병작반수(竝作半收)’라고 하여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식민지 시기에는 50%가 보통이었지만 70~80%인 경우도 있었다. 소작료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소작료 부담 때문에 소작농 생활은 극빈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봄에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춘궁농가’가 자작농은 18.4%였지만, 소작농은 68.1%나 되었다(1930년). 농민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농민의 절반 가까이가 춘궁농가였다.
지주제가 이처럼 극한까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쌀의 상품화와 이출에 적극적이었던 총독부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우선 지주에서 논을 빌린 소작농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 소작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면 지주제가 발달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식민지 시대 지주제는 조선후기 이래 성장한 소농경영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구 증가도 지주제 발달의 한 원인이다. 전염병 예방과 같은 공중위생과 의료시설이 보급됨으로써 조선시대에 0.22%에 불과했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식민지 시기(1911~1940년)에 1.29%로 크게 높아졌다(13회 참조). 상공업의 발달이 미약하여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남을 수밖에 없어 토지 수요가 늘어난 원인도 있다. 소작 수요가 많아 소작료를 높게 받을 수 있었으므로 지주는 여유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 소작을 주는 것이 유리했다.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권 증명제도가 갖추어짐으로써(32회 참조) 토지 거래가 편리해지고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얻기가 용이해진 것도 지주제 발달을 촉진했다.
사회갈등 심해지자 농민에도 관심
지주제가 극한까지 발달하게 되자 지주와 소작인 간 갈등이 심해졌다. 1920년대부터 지주, 특히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가 잦아졌다. 1930년대 이후에는 농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농촌 사회에 계급 갈등이 깊어졌다. 더욱이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 체제를 위협하는 계급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지주를 위주로 하던 총독부의 농업 정책이 농민에게도 관심을 두는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932년부터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자력갱생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1934년에는 ‘조선농지령’을 공포, 소작지 관리자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작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했다. 1939년에는 소작료 인상이나 소작 조건을 소작인에게 불리하게 고치는 것을 금지했다. 1940년부터 식량공출이 시작되자 지주제 발달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식민지 지주제의 완전한 해체가 없이 농민생활의 개선과 농촌사회의 안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재호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