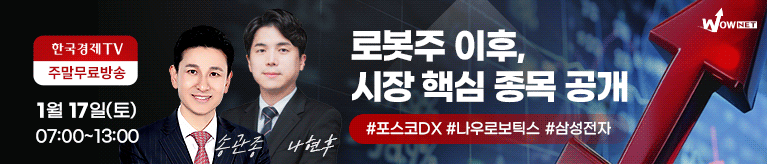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금융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로 가나(62위) 보츠와나(57위) 콜롬비아(70위) 네팔(75위)보다도 낮다. 세계 14위 경제대국이라지만 금융에 관한 한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하다. 서비스혁신이나 해외진출은 고사하고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우물안 개구리식의 단순 영업만 지속해온 결과다. 이러다 보니 심심하면 금융사고가 터지고 소비자보호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보호노력’ 부문 지수가 74.3으로 조사항목 중 두 번째로 낮게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도 할 말이 없다. 아직도 잔존하는 수많은 금융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이야말로 금융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규제혁파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규제가 과연 줄고 있는지 의문이다. 동반성장, 상생, 중소기업, 서민 얘기만 나오면 금융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새로운 규제가 거의 예외없이 새로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금융허브, 녹색금융, 창조금융 등의 구호도 문제다. 그러면서도 정작 금융감독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규제는 많아도 제재는 솜방망이요, KB 사태에서 보듯이 사전감독은 허술하고 사후 제재도 갈팡질팡이다.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지수가 61.3으로 조사항목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당연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 6.4%에서 최근엔 5.5%까지 축소됐다.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발목을 잡을 지경이다. 금융당국 금융산업 모두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