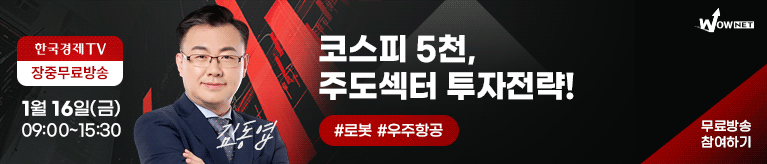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20%가 떨어지며 달러 당 8페소까지 치솟았다.
2011년 520억 달러였던 외화보유액은 7년 만의 최저치인 293억 달러까지 감소하며 중앙은행은 사실상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
떨어지는 통화가치에 물가는 치솟고 있다. 올해 민간기관의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무려 30%에 달한다.
국민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페소를 달러로 바꾸고자 달러매매 규제를 피해 암시장을 찾고 있다.
암시장에서 페소는 현재 달러 당 13.1페소(23일)로 공식 환율과 괴리가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위기 가능성이 촉발된 것은 표면적으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원자재 시장의 가장 큰 손인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그의 후임이자 부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깔려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대부분의 생필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원자재 시장 호황기에 콩, 옥수수 등 주력 생산품의 수출이 크게 늘며 저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사회정책에 정부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다.
국가부채가 늘면 돈을 찍어 갚는 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원자재 시장이 크게 침체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수출이 줄고 달러화 유입이 마르며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평가절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이 방어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24.6% 하락했다.
물가도 그만큼 더 치솟았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경찰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틈을 타 식료품점 약탈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졌다.
WSJ는 "이는 지난 2001년 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다른 신흥국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가 전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영향을 받은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화가치는 24일 사상 최저인 달러당 2.3070리라, 달러당 11랜드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캐피털이코노믹스를 인용, 신흥국의 통화가치 동반 폭락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연상시키지만, 현재와 1997년과의 유사점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