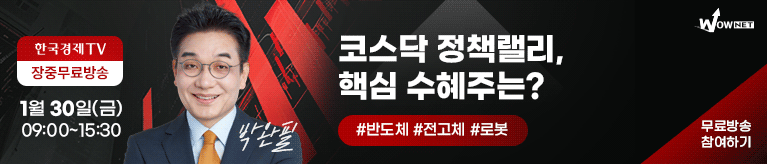그동안 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떼내느냐 마느냐였다. TF는 금소처를 지금처럼 금감원에 두되, 인사·예산권을 갖는 준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부터 모양새가 기이하다. 금감원은 조직이 둘로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고, 금융회사들은 시어머니가 늘어날 염려를 덜었다지만 결국 하나마나한 논란에 헛심만 쓴 꼴이다.
정작 감독기구들의 관심이 감독권력이라 할 금융회사 제재권에 쏠린 것도 볼썽사납다. 개편안에선 금융위 산하에 제재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에 두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되면 검사만 맡는 ‘금융검사원’으로 전락한다며 반발하고, 금융위는 절차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맞선다. 3년 전 무승부였던 ‘사냥터 영역’ 싸움의 재연이다.
선진국에서도 금융감독 체계에 정답은 없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전담조직이 있어야 잘 되고, 없으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의 성패는 금융의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감독기관들이 스스로 소비자보호 기관으로 변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쓸데없는 논란으로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깜짝
▶ 이주노 "2살 많은 장모, 이럴 줄은" 깜짝 고백
▶ 송대관의 추락…166억 빚 때문에 '덜덜'
▶ 女대생, 시험 지각했다고 교수님이 속옷을…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