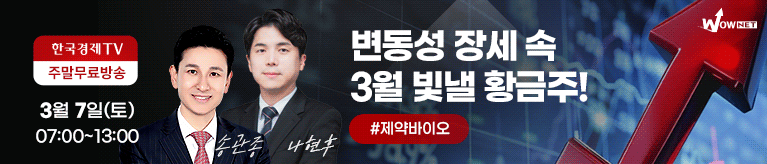증권업계가 수익절벽(revenue cliff)에 직면했다고 한다. 2012년 상반기(4~9월) 순이익은 674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반토막(45.6% 감소)이 났고 증권사의 4분의 1인 15개사는 아예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사라진 지점만도 100여개에 달하고 회사를 떠난 직원 수도 1000여명에 육박한다. 1차적 이유는 거래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1조893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7% 감소했다. 수익의 사실상 절반(49.2%)을 수수료에 의존하는 증권사로서는 수수료 감소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수료가 왜 줄었냐는 데 있다. 그저 시황이 좋지 않은 게 원인이라면 별일이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수수료 감소 추이가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코스피지수는 9% 넘게 올랐지만 거래대금은 오히려 30%나 줄었다. ‘지수상승-거래대금 증가-수수료 증가-증권사 수익 증가’라는 전통의 순환구조가 깨졌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국내 증시는 ‘중산층 재산증식의 장’이기는커녕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온갖 작전과 루머와 불법이 판을 치는 투기판이었고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선물시장→옵션시장으로 밀려나면서 개인투자자가 빈털터리가 되는 건 순식간이다. 껍데기뿐인 기업을 상장한 뒤 돈만 챙기고 선량한 투자자를 울리는 한탕주의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안철수조차 자선금이라는 이름의 정치자금을 증권시장에서 뽑아가지 않았나.
기업의 자금조달도, 개인의 재산증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누가 찾겠는가. 1차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정말 중요한 시장감독이나 소비자보호는 뒷전이고 금융허브니 IB육성이니 구호만 떠들어왔다. 선진적이라는 명분의 제도가 나올 때마다 일반투자자 아닌 투기꾼들에게만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손쉬운 수수료 장사에만 매달린 것도 그렇고 ELS니 뭐니 하며 내놓는 상품마다 고객보다는 자신들의 돈벌이를 우선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소탐대실이자 자업자득이다. 증시 구조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그렇지 못하면 수익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존폐 자체가 문제되는 국면에 처하지 않겠는가.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