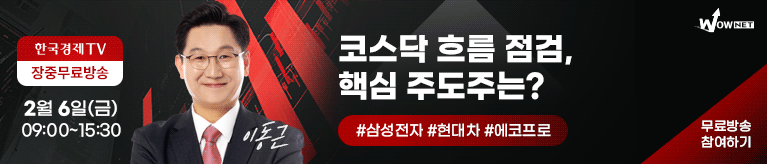케이프타운 성당에 모인 참배객들 국적·나이 불문 추모 한마음

(케이프타운=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양심' 데즈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려는 참배 행렬에는 국적이나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31일(현지시간) 한해의 끝자락으로 연휴 여행 시즌이지만 남아공 남단 케이프타운의 세인트조지 성공회 대성당에는 추모객들의 줄이 200m 넘게 이어졌다.
행사 관계자는 "어제만 1천800명이 몰려왔다"면서 이날 마지막 공개 참배 시작인 오전 9시부터 한두 시간 만에 500명 정도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쪽 팔에 붕대를 한 채 찾아온 아네(21·여)는 "투투 대주교는 평화를 대표한다"면서 과거 백인 소수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맞선 투쟁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추모했다.
세인트조지 성당 안 제단 쪽에 마련된 빈소에는 가장 값싼 관으로 장례를 해달라는 투투 대주교의 유지대로 미백색 소나무 관이 놓여 있었다. 고인을 덮은 관 뚜껑 위에는 흰 카네이션 한 다발만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양쪽에 촛대가 놓여 있는 관 앞에서 저마다 잠시 성호를 긋거나 고개를 숙여 묵도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성당 내부는 사진 촬영 등이 일절 금지됐다.
세이트조지 대성당은 투투 대주교가 1986년부터 10년간 케이프타운 대주교로 봉직한 곳이다.
행사 입장 전 성당 좌측 벽면에는 꽃다발을 놓는 곳이 마련돼 있고 사람들이 와서 기념촬영을 하거나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다. 참배 후에 방문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짐바브웨 출신 화가인 레바니 시렌제(44)는 투투 대주교 그림을 직접 그려서 들고 현재 거주하는 남아공 경제중심 요하네스버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 케이프타운까지 와서 조문했다.
시렌제는 "내가 그린 다른 그림과 함께 투투 주교 재단에 기증할 것"이라면서 "남아공을 '무지개 나라'라고 부른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뿐 아니라 짐바브웨, 나이지리아까지 포괄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용감하게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해 사자후를 토하고 이후에는 진실과화해위원회(TRC)를 이끈 데 감동하였다"고 말했다. 1996∼1998년 활동한 TRC는 인권유린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목표로 했다.

손녀인 듯한 네 살배기 여자아이와 함께 고인을 추모한 베릴(59·여)은 "투투 대주교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유머러스해서 너무나 존경했다"라면서 "내년부터 이곳 성당 학교에 다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려고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른 아침 7시께부터 교회 밴드로 참여해 트럼펫을 연주한 먼로 미나르는 투투 대주교에 대해 "선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사람들을 특히 사랑했다"고 기렸다. 교회 청년·소녀 밴드는 흑인 타운십을 비롯해 웨스턴케이프주 지역사회에서 100명 넘는 아이들과 성인으로 이뤄졌으며 시신이 아침에 성당에 운구되기 전후로 '주께 드리네' 등의 가락을 힘있게 연주했다.
투투 대주교의 관은 승합차에 실려 이날 오전 8시 조금 전에 도착했으며 20명 남짓의 검은 사제복을 입은 성직자들이 도열해 맞이했다.

유가족으로는 네 자녀 가운데 둘째 딸 논톰비를 비롯해 손녀, 사위 등이 영접하고 밴드 등에 사의를 표했다. 부인 레아 여사는 휠체어를 탄 채 성당 안에 있었다고 한다.
이날 정오에는 투투 대주교 선종 다음날인 지난 27일부터 매일 하던 관례대로 10분간 대주교를 추모하는 성당 종이 울려 퍼졌다.
다음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장례미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성당 주변 블록은 사방으로 차량 통행이 차단되고 취재진 등 비표가 있는 사람만 통행이 허용됐다.
취재진은 국내외에서 243명 이상이 등록해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전날 밤에도 케이프타운 시청 앞에는 투투 대주교의 사제복 색깔인 보라색 조명이 비추고 사람들이 몰려 기념 촬영을 했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4차 감염파동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면서 전날부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통행금지령을 해제했다. 그러나 전날도 1만2천 명대 확진자가 나올 정도여서 세인트조지 성당 내 장례식은 예정대로 100명 이내로만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