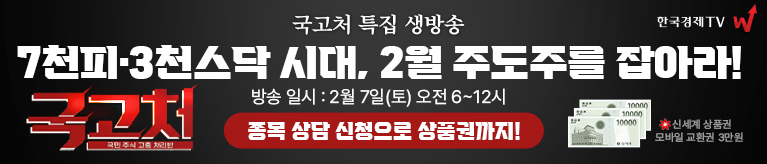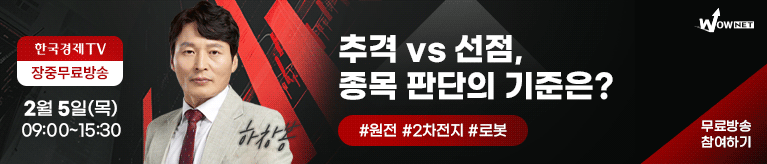최수희 서울대병원 교수 "공황발작 또 올까 봐 두려운 게 공황장애"
"누군가는 위가 약해 소화불량 시달리듯 각자 취약점 다른 것 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A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심장이 쿵쿵대면서 숨이 답답한 느낌이 들고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공황발작'을 겪었다. 공황발작이 잦아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는 것을 꺼리게 됐고, 출근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하기가 어려워졌다.
실제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례다. 연예인들이 자주 언급한 덕분에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대중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연예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적시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할 수도 있다.
공황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황장애와 공황발작을 구분해야 한다. 공황발작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불안, 급격한 공포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개 이러한 공포는 수 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다가 20∼30분 후면 사라진다.
공황발작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는 아니다. 이러한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공황발작이 또다시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기 시작하면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야 한다.

최수희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4일 "흔히 숨이 가쁘거나 질식할 것 같은 공포 등을 동반하는 공황발작을 공황장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공황발작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공황장애"라고 설명했다.
공황장애 환자는 공황발작이 두려운 나머지 공황발작을 겪었던 장소나 그와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꺼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때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방치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최 교수는 "공황장애 환자는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러한 증상 때문에 대중교통을 탈 수 없거나 특정 공간이나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괴로움이 된다면 의사와 상담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황장애가 의심돼 병원에 방문했다면 우선 부정맥, 천식, 갑상선 항진증 등은 아닌지를 확인한 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공황장애와 혼동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므로 초기에 잘 가려내야 한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는 특정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바로잡고 왜곡된 생각을 교정해 불안과 공포를 완화하는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치료를 받을 때는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된다.
최 교수는 "공황장애 치료는 환자가 특정 상황이나 장소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불안한 상황을 감내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공포와 불안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황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좌절하거나 스스로가 나약하다고 탓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위가 약해 소화불량에 시달리듯 각자의 취약점이 다른 것뿐"이라며 "공황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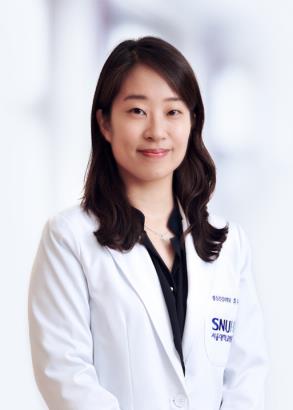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