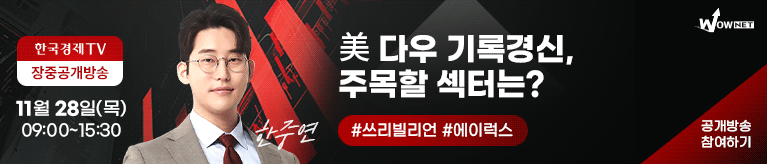올해에만 628명 피랍…대상 안 가리고 납치해 몸값 요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캐나다인 선교단 17명이 납치된 카리브해 아이티에선 올해 들어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아이티 비영리기구 인권분석연구센터(CARDH)의 이달 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이티에선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모두 628명이 납치됐다.
7월 31명, 8월 73명, 9월 117명 등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납치범에게 몸값을 준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납치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19일 AP통신이 인용한 유엔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이티 경찰에 신고된 납치 건수는 328건이었다. 2020년 전체 신고된 234건보다 크게 늘었다. 신고 안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납치 범죄는 주로 전문 범죄조직의 소행이다.
보통 몸값을 내놓을 만한 중산층 이상이 납치의 주요 타깃이 되지만 딱히 대상을 가리지도 않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학교 가는 아이들, 노점상, 설교 중인 성직자까지 부자든 가난하든 납치에 안전한 아이티인은 거의 없다"고 표현했다.
몸값은 대상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달라진다.
아이티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 노동자들이 치안 불안에 항의하며 18일 전면 파업 시위를 선언한 것은 언제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아이티 국민 전체에 팽배함을 보여준다.
지난 8월 대지진으로 2천200명이 숨지는 등 아이티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구호 활동을 위해 들어온 활동가나 선교사들도 납치의 표적이 됐다.
이번에 납치된 선교단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기독교 자선단체에서 파견된 이들로 대지진 이후 재건 사업을 돕고 있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지난 6월엔 한국인 선교사 부부도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에서 납치됐다 1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전체 인구의 60%가 빈곤층인 아이티는 예전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니었다.
연이은 대지진과 허리케인, 극심한 빈곤, 정치 혼란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치안은 더욱 악화했다. 이러한 여러 불행 요인들이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과 실업 증가는 범죄 증가로 이어졌고, 치안이 악화하자 아이티를 위기에서 구할 국제 구호단체들도 하나둘 철수했다. 여기에 더해진 정국 혼란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혼돈을 심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아이티 갱단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이라고 말한다.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당시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재발을 우려해 군대를 해체한 상태였고,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는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정부가 빈민가 민간인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지난달 아버지가 납치됐던 아이티계 미국인 도리스 미셸은 납치 급증의 책임은 아이티 정부에 있다며 "그들이 갱단을 만들었다. 이제 그 괴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AP에 말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곳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일대다.
현재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40%가 갱단에 장악된 상태라고 AP통신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선교단 납치 배후인 갱단 '400 마우조'는 2010년 대지진 이재민이 모여 살던 지역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 외곽 크루아데부케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스에 따르면 아이티 납치 10건 중 9건이 수도권에서 벌어지며, 이 지역 납치 건수는 이미 대도시 멕시코시티나 브라질 상파울루보다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후 아리엘 앙리 총리가 대신 이끄는 정부는 급증하는 범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18일 건국 영웅 추모 행사에 참석하려 했던 총리 일행이 갱단의 총격에 결국 철수하기도 했다.
현지 인권 활동가 피에르 에스페랑스는 로이터에 "출범 3개월째인 정부는 현 상황에 무력하다"며 "치안 불안에 대처할 계획도 방법도 없다. 경찰력이 강화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