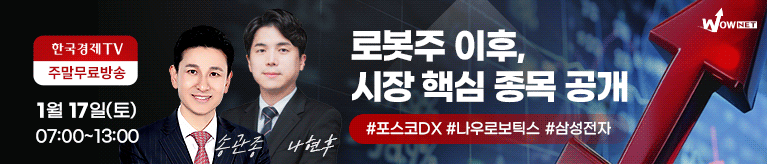자가 격리 이어지며 '코로나 블루' 증상
"주변 시선 의식하며 두려움에 떨어"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영국의 한 전직 경찰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후 가족을 지키려고 스스로 격리에 들어갔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제임스 코널리 웹스터(58) 전 플리머스 경찰서장은 지난 3월 말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아내와 두 자녀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해 자택 정원의 오두막에서 8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
격리 기간 가족은 화상통화로 웹스터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부부는 정원을 사이에 두고 아침에 종종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했다.
웹스터도 격리 초반에는 아침마다 커튼을 열어젖히며 날씨가 좋다는 말을 전하는 등 변화한 생활에 적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택한 격리 생활은 정신적 고통으로 돌아왔다. 일명 '코로나 블루'가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 블루는 최근 바이러스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일상 생활의 제약과 감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현상을 말한다.
웹스터의 아내 모린은 남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격리된 후부터 예민해지고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격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웹스터는 가족과의 접촉을 꺼리고, 이웃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의 아들 맥스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웹스터는 결국 지난 4월 1일 잉글랜드 남서부 콘월주 크래킹톤 헤이븐에 있는 자택 정원의 한 오두막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웹스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웹스터는 사망 당시 오두막집 문 앞에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메모를 남겼다. 메모를 본 아들 맥스가 웹스터의 시신을 발견하고 응급구조대를 불렀으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웹스터의 침대 맡에 놓여있던 6쪽짜리 메모에는 그가 격리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쓰여있었다.
모린은 "남편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두려움 등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신경적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면서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사실들은 최근 웹스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면서 공개됐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