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독재성향 강화…선진국들도 개인정보 사용권한 확대
코로나19 끝나도 원위치 난망…"9·11테러급 사회적 여파 예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표결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거 자체를 막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다.
안 그래도 입법부를 자신의 심복으로 채우고, 야권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앞둔 오르반 총리는 이제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만큼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반대 여론 탄압도 가능해졌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전염병 확산 억제를 이유로 개인과 사회를 밀착 감시하는 빅브라더식 체계가 고소득국들에서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벨기에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업체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이 주요 거리에 배치돼 휴대전화 업체가 놓친 부분을 감시한다.
벨기에 의회도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기로 해 의회 전체 표결이 아닌, 정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자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승인했다.
프랑스에선 선거가 연기됐다.
슬로바키아 국회의원인 토마스 발라섹은 "독재자와 자유제한론자들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민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맞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을 손에 넣은 지도자들이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자신들의 권한을 순순히 내놓을지가 문제다.
과거에도 보면 정부가 극도의 불안을 빌미 삼아 행정조치를 취했다가 이를 필요 이상 기간 동안 유지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는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1981년 암살당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이를 31년간 유지했다.
프랑스도 2015년 테러 공격 발생 이후 발동한 비상사태를 2년간 유지했으며 미국도 9.11 테러 이후 수용소를 개설한 관타나모 수용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드론 표적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애국법에 따라 대중감시도 여전히 가능하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법 국제센터의 더글러스 러첸 센터장은 "전 세계 정부가 비상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기 주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휘권은 사회의 구조에 스며들게 된다"면서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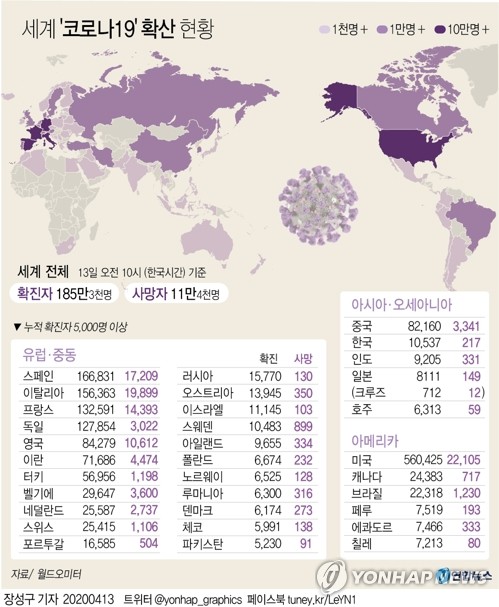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