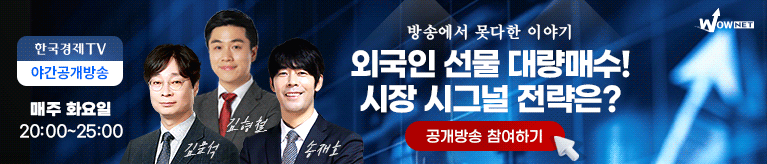국립공원 내 사찰 23곳 포함 67곳서 징수…해결책 없이 헛바퀴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박상현 기자 = 일부 사찰이 입장객에게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회적 문제다.
문화재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 문화재관람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찰을 통과해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왔다.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모두 67곳이며, 그중 23곳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다. 인제 백담사, 무주 백련사와 안국사가 국립공원 내에 있으면서도 문화재관람료를 걷지 않는다. 등산객 민원이 많은 사찰로는 속초 신흥사, 보은 법주사, 정읍 내장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전남 구례 천은사가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으나, 대부분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의 52%는 사찰 유지보존 비용으로 사용하고, 30%는 문화재 보수와 매표소 관리·교육에 쓴다. 12%는 종단 운영에 들어가며, 5%는 승려 양성을 위해 활용한다.
정부는 사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조계종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뚜렷한 합의 없이 시간만 흘렀다.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1990년대 후반에도 있었다. 조계종과 정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또 2000년 12월에는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를 최고 3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2007년 본격화했다.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앴으나,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해서 징수하자 등산객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조계종은 "사찰 소유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 제도 정착과 운영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며 문화재관람료가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이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으로 중첩돼 관리되고 있다"며 전통사찰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고, 조계종과 정부 간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조계종은 사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20일에도 문화재관람료 논란 원인이 정부 정책 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금임에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2007년 폐지하면서 오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한쪽으로는 사찰이 보존하고 가꿔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오심 스님도 종단이 '산적'이라는 표현을 듣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요구 사항은 2007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유재산 이용에 대해 보상하고, 전통사찰 보존관리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일하라는 것이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장소를 사찰 입구로 조정하고, 관람료 사용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찰에 대한 불만도 있다.
불교계 관계자는 "조계종이 말하는 '보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일단 정부와 조계종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