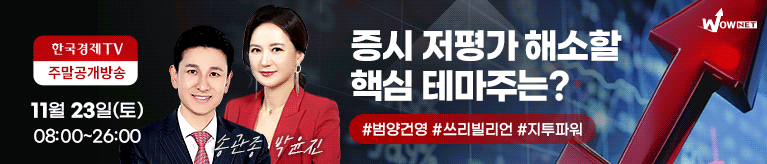기획 요건 맞아떨어진 광주 '선택'
시나리오에 따라 편의대 선동·계엄군 작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두환 신군부가 사전에 기획한 것이라는 한·미 정보요원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5·18 기획설은 39년이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신뢰할만한 관계자 증언이나 증거가 없어 일각에서는 음모론일 뿐이라고 치부해 왔다.
하지만 미 육군 501정보단 출신 김용장 씨와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 씨가 14일 광주에서 밝힌 증언의 무게는 남다르다.
김 씨의 경우 광주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미국에 보고하고 있었고, 허 씨는 신군부가 기획한 시나리오를 직접 수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5·18은 신군부가 사전에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광주는 단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엮으려는 신군부의 '선택'을 받은 도시였다.
김씨는 "광주는 역사적으로 항상 항거하는 도시였다"며 "지형적 위치와 도시 규모, 김대중과의 연관성 등 '폭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의 경우 도시의 규모가 적고 너무 남쪽에 있어 작전상 적절하지 않았고, 전주와 대전의 경우 규모는 적당했지만 김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거나 서울과 너무 가까운 점 등이 배제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김씨는 분석했다.
이렇게 광주를 선택한 신군부는 일반 시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민들을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릴 특수 공작부대 '편의대'를 광주로 내려보냈다.
5·18이 시작되기 전인 5월 14~16일 사이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편의대를 김씨의 눈으로 목격했다.
김씨는 군 수송기를 타고 온 30~40명이 격납고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격납고 근처를 찾아갔다가 짧은 머리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20대 후반~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 중 한 사람은 넝마처럼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그나마 나은 옷을 입었다"며 "당시에는 이런 사실만 상부에 보고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편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허씨도 이러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그는 "전두환이 작성한 '양지일지'에는 홍석률 대령을 선무대장(편의대장)으로 광주로 내려보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당시 비행일지에도 선무공작원 몇 명이 탑승해 광주로 왔다는 기록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1988년 광주청문회 당시 '5월 항쟁 기간 왜 그렇게 광주에 자주 내려갔느냐'는 질문에 "대원들 편의복을 가져다주러 갔다"고 답변한 점도 편의대 활동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언급됐다.
이들은 편의대는 5월 항쟁 기간 내내 시민으로 행세하며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기 위한 선동과 유언비어를 이끌었다고 증언했다.
허 씨는 "편의대에는 무기고 습격조, 유언비어 유포조, 장갑차 탈취조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며 "아시아자동차에서 군용 장갑차(APC)를 탈취해 운행한 것도 편의대의 소행"이라고 강조했다.
5월 항쟁 기간 공수부대를 포함한 계엄군도 보안사의 지휘를 받아 각본대로 움직였다.
5월 21일 공수부대가 시민군에 밀려 시 외곽으로 퇴각한 것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허씨는 설명했다.
그는 "민주화의 물결이 계엄군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시 외곽으로 빠진 군은 그때부터 광주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이유 불문하고 사살했다"고 말했다.
특히 "무장도 제대로 안 된 시민군이 몰려온다고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들이 퇴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광주를 폭도로 몰고 자위력 구사라는 시나리오를 성립시키기 위해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군부의 기획은 미국의 묵인 또는 방조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씨는 "당시 미국 카터 정부로서는 정통성이 없는 전씨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으면 일하기가 쉬웠다"며 "미국은 (5·18과 관련해) 전씨에게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사후에 묵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