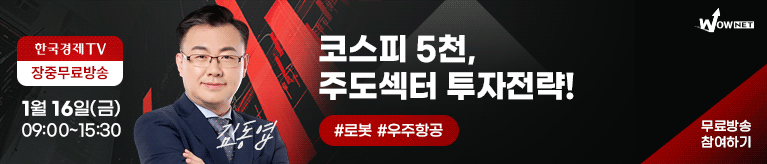2017년 개장·폐모 허가건수, 5년전보다 30% 증가
폐차·폐가전더미 옆에 불법투기 사례도, '가족·친지연결 묘 역할은 옛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고향에 있는 선대의 조상묘는 도회지에 사는 후손들에게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핵가족화와 저출산에 더해 바쁜 현대 생활로 성묘가 뜸해지다 보니 사실상 무연고묘가 된 곳도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자연히 조상묘를 주거지 가까운 곳으로 이장하거나 납골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묘 해체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묘 이전이나 폐묘에 필요한 개장허가건수는 10만4천493건으로 5년전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다. 도시집중과 인구감소로 폐묘를 선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폐묘 움직임은 핵가족화가 정착한 19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에 있는 묘라쿠지(妙?寺) 사원은 40여년 전부터 묘지에서 철거한 비석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 절이 인수한 비석은 약 2만개다. 경내 산을 절개한 경사지에는 비석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다. 스즈키 마사히코(鈴木政彦) 주지는 "비석 2만개에는 2만가지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양 독경을 한다.
해체하거나 폐묘한 비석 모두 이런 정중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미에(三重)현의 한 지역에는 폐차된 차량과 폐기된 가전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한켠에 대량의 비석이 방치돼 있다. "공양지(供養地)"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지만 잡초가 무성해 '공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론 정중하게 '공양'을 하는 곳도 있다. 미에현 서쪽 나라(奈良)현과 접해 있는 나바리(名張)시에는 비석해체업체 비쇼(美匠)가 운영하는 '영구공양안치소'가 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비석이 줄지어 늘어선 안치소가 나타난다. 에도(江戶)시대의 연호가 새겨진 비석이나 불교 종파를 알아볼 수 있는 비석이 있는가 하면 옛 일본군 전사자 추모용으로 제작된 비석도 보인다. 하나 하나 살펴보면 해당 가족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전하는 비석으로 애지중지해 왔다는 느낌이 든다.
나카니시 아자미(41) 사장에 따르면 10년전 500평의 부지에 설치한 안치소에 비석 5천여기가 안치돼 있다. "자녀에게 승계할 수 없어 폐묘하고 싶다"거나 "비석 처리가 고민"이라는 문의가 연간 1천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회사는 기존 안치소가 곧 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처에 새로 안치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중 21개 도도부현에서 개인이나 석재상으로부터 비석해체 의뢰를 받았다. 맨 윗부분의 곧게 선 비석을 1기당 1만 엔(약 10만 원)에 크레인으로 옮겨온다. 안치소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승려가 공양도 한다.
개중에는 비석 처분을 맡은 업자가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효고(兵庫), 이바라키(茨城), 미야기(宮城)현 등에서 비석해체업자가 폐기물처리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며 비석 해체로 돈벌이를 하려는 악덕업자가 전국에 차고 넘친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무덤과 비석은 가족과 친척을 묶어주는 기념물의 기능을 해왔지만 "그런 역할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