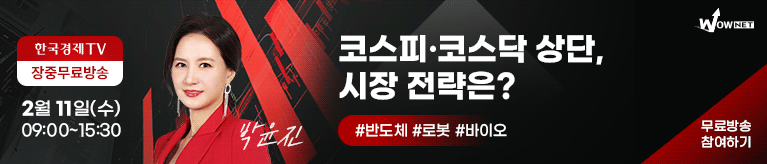신흥국 주식펀드 20조원 순유입…강달러 주춤에 신흥국 통화 상승세
경제전망 악화 등 리스크 여전…"'비둘기' 중앙은행, 청신호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 제동이 걸리고 미중 무역전쟁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흥시장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우려로 외면받았던 신흥국 주가지수와 통화 가치는 올해 급등했다.
MSCI 신흥시장 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두 달간 9.9%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각종 악재에 외면받았던 중국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18% 올랐으며 홍콩 항셍지수는 11% 각각 뛰어올랐다.
한국과 호주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도 9% 안팎으로 올랐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주요 주가지수 상승률은 10%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미국 달러가 독주하면서 급락했던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JP모건 신흥시장 통화지수는 올해 들어 2.5% 올랐다. 작년 10% 이상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작년의 낙폭을 모두 회복하진 못했으나 올해 신흥국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주요 16개국 통화 가운데 달러 대비 상승한 통화는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2.4%)를 비롯해 2개 통화뿐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브라질 헤알(3.9%),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3.1%), 멕시코 페소(2.5%) 등 9개 통화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이달 중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신흥국 금융자산 매수를 가장 '활발한(crowded)' 거래로 꼽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 바람에 미국 달러 매수는 2위로 밀려났다.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중순까지 신흥국 주식펀드는 186억달러(약 20조8천억원) 자금 순유입을, 미국 주식펀드는 414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연준의 긴축 기조가 한풀 꺾인 데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이어가면서 무역전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드는 등 글로벌 위험자산의 두 가지 최대 우려가 진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감세와 재정 확대 효과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반면, 신흥국 성장 전망은 선진국보다 높아 신흥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
블룸버그가 신흥국 경제성장률과 전문가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7년간 대부분 기간에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평균 3%포인트가량 높은 성장률을 보였거나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아밋 메흐타 글로벌 신흥시장 국장은 "미국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작년 미국 성장률이 정점을 찍은 듯한 반면에 전반적으로 신흥시장 성장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자산 투자가 앞으로 장기간 확대될 것으로 보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성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모하메드 엘에리안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블룸버그 칼럼에서 "우리는 대부분 국가가 동시에 성장률 상승을 경험한 2017년 말∼2018년 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유럽과 중국 경제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며 이것이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위험자산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 강하게 이어진다면 현재 연준의 기조가 시장에 반영된 것 이상으로 덜 완화적으로 될 수 있는 반면, 외부 여건은 악화해 연준에 '시장과의 소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과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2018년 위협했던 것처럼 펀치볼을 치우는 대신 다시 채워 넣고 있지만, 이것은 청신호가 아니라 더 까다롭게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