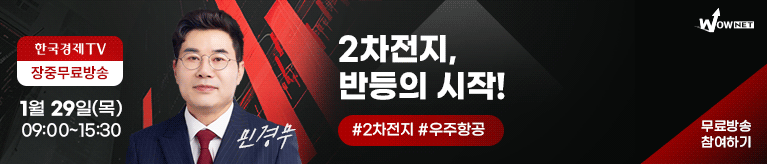열악한 환경·비인기 종목 설움 딛고 메달 수확
생소한 신규 종목들에서도 선전

(자카르타=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불모지에도 싹이 트고 꽃은 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종목 중에는 일반인들에겐 이름조차 낯선 종목들도 있지만 태극전사들은 이들 종목에서도 낮은 관심과 지원, 좁은 저변을 딛고 귀중한 메달을 수확해 잔잔한 감동을 줬다.
비인기 종목의 메달 신화를 쓴 대표적인 종목은 '카바디'다.
인도의 전통놀이에서 유래한 종목인 카바디는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치러졌고, 2010 광저우 대회부터는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에 출전했지만 인기를 논하기조차 무색할 만큼 인지도가 낮다.
2014 인천 대회에선 남자 대표팀이 동메달도 땄지만 여전히 실업팀도 전무하고, 전용구장조차 없다.
2007년엔 협회가 설립됐으나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진천선수촌에 입촌할 수도 없었고 단복이 없어 결단식도, 개회식도 가지 못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력을 갈고닦은 선수들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종주국 인도를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인도는 아시안게임에서 한 차례도 정상을 내주지 않은 철옹성 같은 팀이었으나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표팀에 패배를 당했다.
인도를 꺾은 대표팀은 여세를 몰아 처음 결승까지 진출했다.
비록 이란에 패해 우승은 내줬지만 결승전 방송 중계조차 되지 않은 무관심 속에서 일궈낸 값진 은메달이었다.
인도의 프로 카바디리그에서는 인기 스타인 주장 이장군(벵골 워리어스)은 "진천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에 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했다"며 "비인기종목이라 더 노력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족구와 비슷한 세팍타크로의 경우 카바디보다는 국내 인지도도 높고 역사도 긴 편이지만 종주국 태국의 '넘사벽' 위상 탓에 우리나라가 '변방'이라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안 하는 스포츠가 없는' 우리나라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서클(원형경기)에서 정상에 오르며 동남아를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후에도 금메달은 없지만 꾸준히 메달 사냥엔 성공했고 이번에도 여자 팀 레구에서 태국에 이어 은메달, 남자 레구에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세팍타크로의 경우 실업팀 선수는 40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동남아 강호들을 제치고 얻어낸 값진 메달이었다.
곽성호 여자 대표팀 감독은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을 다 합쳐도 웬만한 동남아 국가의 한 지역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고등학교를 다 합쳐도 선수가 300명도 안 되는 남자팀도 비록 '말레이시아 특혜'에 유탄을 맞아 서럽게 결승 문턱에서 돌아서긴 했으나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그것도 아시안게임 종목이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올 법한 신설 종목들에서도 태극전사들은 메달을 수확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종목이 된 주짓수에선 성기라(21)가 여자 62㎏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내에서도 취미로는 꽤 많은 이들이 향유하고 있으나 정식 스포츠로서의 인식은 아직 희박하고 실업팀도 없는 주짓수에서 거둔 뜻깊은 메달이다.
역시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데뷔한 패러글라이딩에서 금메달을 딴 크로스컨트리 여자 단체의 이다겸(28), 백진희(39), 장우영(37)과 스케이트보드 동메달을 딴 은주원(17)도 체계적인 지원 없이도 스스로 '즐기던' 것들에서 메달을 일궈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