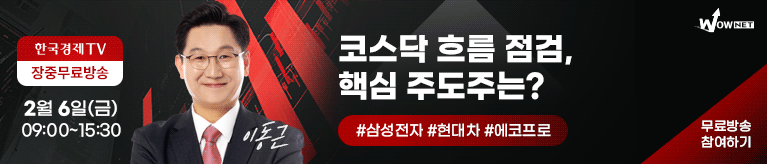1988년부터 시작돼 올해 30주년…관행이 된 것은 1994년부터

(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30일(한국시간) 미국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클럽 다이나 쇼어 코스(파72)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번째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자는 18번 홀 그린 옆 '포피의 연못'에 뛰어드는 전통으로 유명하다.
ANA 인스퍼레이션 챔피언의 연못 다이빙은 1988년 시작됐다. 올해가 30년째다.
대회에 앞서 열린 주요 선수 기자회견에서 생각해둔 다이빙 자세와 누구와 함께 뛰어들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쏟아진 이유다.
연못 다이빙의 '원조'는 1988년 챔피언 에이미 앨콧(미국)이다.
앨콧의 연못 다이빙은 그러나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었다.
당시 '포피의 연못'은 지금처럼 깔끔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근사한 장소가 아니었다. 연못에 고인 물은 음침한 기분까지 느낄 만큼 어둡고 탁했다.
앨콧의 회고에 따르면 챔피언 퍼트를 마치고 나서는 충동적으로 캐디 빌의 손을 잡고 "자, 한번 뛰어보자"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둘은 손을 잡은 채 연못으로 달려가 몸을 던졌다.
앨콧은 "연못은 오물과 세균 투성이였다. 더러웠다. 분별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 그런데 관객들이 좋아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연못 다이빙은 한 번으로 끝나는 듯했다.
이듬해 우승자 줄리 잉스터(미국)와 1990년 챔피언 벳시 킹(미국)은 연못에 뛰어들지 않았다.
1991년 앨콧은 다시 우승했다.
이번에는 우승하면 연못에 뛰어들기로 미리 작정했다.
미리 작심한 데는 이 대회 창설자이고 후원자인 유명 여배우 겸 가수 다이나 쇼어와 1년 전에 한 약속이 있었다.
1990년 어머니를 잃은 앨콧에게 쇼어는 "네가 내 대회에서 또 우승하면 같이 연못에 뛰어들겠다"고 약속했다.
쇼어는 골프 선수가 아니면서도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만큼 LPGA투어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포피의 연못' 옆에 서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쇼어다.
대회 땐 늘 흰색 바지만 입던 쇼어는 1991년 대회 최종일에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옆에는 욕실용 가운을 든 수행원이 서 있었다.
앨콧이 우승하자 약속대로 연못에 몸을 던졌다. 연못은 그때도 더러웠다.
그렇지만 우승자의 연못 다이빙이 이 대회 관행과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건 쇼어가 세상을 뜬 다음이었다.
1994년 도나 앤드루스(미국)가 3년 만에 챔피언의 연못 다이빙을 재연했다. 대회 한 달 전에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난 쇼어를 기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제야 이 대회 우승자는 트로피와 함께 목욕 가운을 챙기는 전통이 생겼다.
그런데 연못 물은 여전히 불결했다.
1997년 우승자 벳시 킹(미국)은 "수면 위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1999년 챔피언인 도티 페퍼(미국)는 연못에 들어갔다가 귀에 세균이 감염됐다. 페퍼는 이듬해 카리 웹(호주)이 우승하자 "항생제를 챙기라"고 조언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승자의 연못 다이빙이 관행이 되자 연못의 수질을 개선하고 연못 주변 조경을 다듬었다.
지금은 염소 소독을 마친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연못의 수질은 수영장 수준으로 유지한다. 실수로 물을 삼켜도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30년이 됐지만 2년씩 두 차례나 챔피언 다이빙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다이빙 횟수는 26번이다.
첫 다이빙 때 앨콧은 캐디와 둘이 뛰었지만, 점차 우승자와 함께 다이빙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캐디는 늘 함께였고 부모 등 가족이 합류했다.
지난해 우승자 유소연(28)은 캐디,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등 4명과 함께 다이빙했다.
2008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우승했을 때는 난리가 아니었다.
무려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초아와 함께 연못에 뛰어들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까지 다 불렀는데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오초아의 캐디는 "로레나가 물속에서 누군가와 포옹하길래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더러 "아까 나랑 포옹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라"고 회고했다.
심지어 연못가에는 멕시코 전통 음악 연주단인 마리아치의 공연까지 벌어져 포피의 연못 일대는 떠들썩한 파티장과 다를 바 없었다.
처음에는 달려가서 연못에 뛰어들기만 했지만, 다이빙 세리머니도 점점 진화하는 추세다.
2004년 우승자 박지은(36)은 다이빙한 뒤 연못 속에서 여유 있게 수영을 했다. 박지은은 어릴 때부터 수영 솜씨가 뛰어났다.
2016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다이빙했다.
2006년 대회 때 최종 라운드 18번 홀에서 극적인 이글을 잡아 연장전에 진출, 오초아를 꺾고 두번째 우승을 차지한 웹(호주)은 거의 올림픽 다이빙 선수처럼 뛰어들어 언론은 '총알 다이빙'이라고 보도했다.
수영할 줄 모르는 팻 허스트(미국)는 1998년 대회에서 우승하자 다이빙 대신 슬슬 걸어서 연못에 발만 담그고 말았다.
허스트처럼 수영을 못하는 쩡야니(대만)은 그러나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다. 쩡야니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이 대회에서 세 차례나 우승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두번째 우승했을 땐 걸어서 입수했다.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캐디의 딸을 데리고 들어가느라 점프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세번째 우승했을 때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힘차게 점프했다.
2011년 챔피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의 어머니 캐롤은 딸과 함께 연못에 뛰어들다 발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캐롤이 사고를 당한 뒤 입수 지점 부근은 수심을 더 깊게 파고 주변을 정리했다.
kh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