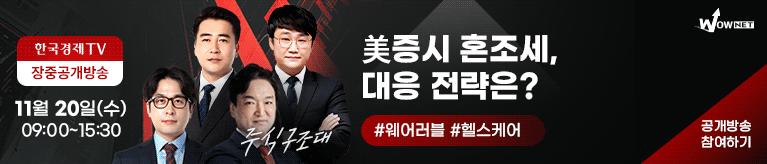새 시집 '꽃 밟을 일을 근심하다' 출간…"인류 조화·공감의 '고대성' 되찾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등단 30년이요? 어이쿠, 오래도 살았네 싶기도 하고, '시'라고 하는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줬다는 느낌,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석남(52) 시인은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등단 30년을 맞은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198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은 이번에 새로 출간한 시집 '꽃 밟을 일을 근심하다'(창비)까지 8권의 시집을 냈다. 그동안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김달진문학상 등 주요 시문학상을 받으며 주목받았고 전통 서정에 바탕을 두면서도 참신한 감각을 빚어내는 '신서정파'의 대표 시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문단에서 굵직한 이름이 됐지만,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소년 같은 수줍음과 떨림이 있었다.
"돌아보면 30년 전 소년이던 시절도 좋아요. 그때도 첫눈 올 때처럼 춥지만 뭔가 기대감, 설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분이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갔는데, 꾸준히 쓰니 이제 여덟 번째(시집)까지도 됐네요. 이번 시집은 특히 새로 출발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뭔가 자유로워졌다고 할까, 눈이 오면 세상이 하얗고 단순해지는 것처럼 저도 하얗게 다시 칠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노안이 오는 게 어떤 상징 같다고 했다.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먼 데는 잘 보인다는 게 재미있어요. 가까운 것만 보던 세계관에서 나아가 이제는 먼 데를 더 또렷이 보라는 것 아닐까요?"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이번 시집에서 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을까.
"젊었을 때의 미래는 보이지만, 젊음이 다 가시고 난 다음의 미래란 게 죽음 같은 건데요. 육체나 인생의 죽음이야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더불어 큰 한 배를 탄 인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미래라는 게 뭘까 많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 출발점을 들여다보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인류의 출발이 어떤 건가."
그가 상상하는 인류의 출발점에는 조화로움과 부드러운 뭉뚱그림이 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분열과 부조화 같은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많은 오해들이 생기듯이 언어의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미끄러짐, 날카로움 때문에 그런 분열과 부조화,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세계의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고대(古代)적인 어떤 것의 뭉뚱그림, 날카로운 게 아니라 부드럽고 뭉쳐진 언어, 그 침묵을 읽고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이름으로서의 고대라기보다는 저 먼 출발점, 언어 이전의, 말 걸기 이전의 떨림과 설렘과 그리움…그런 세계로 가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고대성'은 이번 시집의 3부 '고대(古代)에 가면'에 묶인 시들에 잘 나타나 있다.
"나에겐 쇠 뚜드리던 피가 있나보다/대장간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안쪽에 풀무가 쉬고 있다/불이 어머니처럼 졸고 있다-침침함은 미덕이니, 더 밝아지지 않기를//불을 모시던 풍습처럼/쓸모도 없는 호미를 하나 고르며/둘러보면,/고대의 고적한 말들 더듬더듬 걸려 있다//주문을 받는다 하니 나는 배포 크게/나라를 하나 부탁해볼까?/사랑을 하나 부탁해볼까?/아직은 젊고 맑은 신(神)이 사는 듯한 풀무 앞에서/꽃 속의 꿀벌처럼 혼자 웅얼거린다" ('대장간을 지나며-古代' 전문)
이런 새로운 화두뿐 아니라 그의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반가워할 고요한 서정의 세계도 그득하다.
"평범한 어느 하루 늦은 잠에서 깨었지/베란다 창에서 햇빛 한 자락 다가왔지/나는 그것도 모르고 책을 뒤적이고 있었지/한데 어느덧 햇빛 한 자락이 문득/내 발가락 하나를 물더군/아프지는 않았지 나는/놀라지도 않고 바라보았지 햇빛은 계속해서/내 발을 먹었지 발목까지 먹었지/나는 우는 대신 깔깔대고 웃었어" ('어느 겨울날 오후에 내 발은' 중)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이 시집의 해설에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다. 포스트휴먼이 운위되는 시대에 이런 뜻밖의 고대인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말이다. 그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인간 가장 인간적인 인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보라는 뜻일 것이라고 나는 받아들인다"고 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