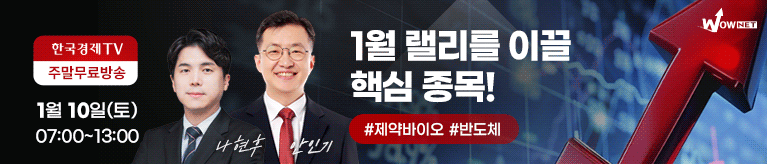빗자루 명인 배영희씨 부산 무형문화제 등록 신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낙동강 유역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갈대 군락으로 뒤덮인다.
가을바람에 일렁이며 황금 물결치는 갈대 군락은 1960년대만 해도 낙동강 유역 주민에게는 중요한 생계 터전이었다.
주민들은 품질 좋은 갈대를 수확한 뒤 엮어 차양발, 빗자루, 김발(부산 앞바다 생산되는 김을 널어놓는 발)을 만들어 내다 팔며 자식들을 키웠다.
볏짚보다 오래가 지붕을 잇는 데 쓰기도 했다.
1946년에 태어나 올해 71세인 배영희 씨의 가족은 4대째 낙동강 유역인 사상구 감전동 지역 토박이다.

배씨의 가족도 낙동강에 의지해 살았다.
어머니는 낙동강 재첩으로 국을 만들어 양동이에 이고 다니며 팔았다.
아버지는 갈대를 채취해 빗자루를 만들어 판 돈으로 자식들을 먹였다.
배씨도 아버지 영향으로 10살 때부터 빗자루 만들기를 배웠다.
배씨는 "생계가 어렵다 보니 어린 동생과 함께 온 가족이 빗자루 만드는데 손을 거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갈대 빗자루 만들기는 고단했다.
7월에는 빗자루의 자루 부분에 쓰이는 낙동강 수생식물인 부들을 채취하고 말리느라 바빴다.
8월 초에는 꽃이 피기 직전의 갈대만 골라 채집한 뒤 물에 삶고 말리는 작업이 반복됐다.
배씨는 "빗자루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재료 구하기부터 시작해 4개월 정도가 걸린다"면서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10년을 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70년 산업화의 물결이 낙동강 유역에도 미치면서 배씨 가족은 갈대 빗자루 만드는 일로는 더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다.
나일론 빗자루에 밀려 품이 많이 드는 갈대 빗자루는 경쟁력을 잃었다.
아버지는 장사를 접었고 배씨도 그 후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배씨와 갈대 빗자루와의 인연은 그로부터 무려 40년 뒤 다시 맺어졌다.
2014년 낙동강 유역에 생활사박물관이 들어선 게 계기가 됐다.
급격하게 사라져 버린 옛 낙동강 유역의 생활상을 보존하기 위해 사상구청이 설립한 박물관이다.

생활사박물관 학예사들은 낙동강의 명물이던 갈대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박물관 건립 전부터 토박이를 상대로 수소문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러기를 몇 달,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 할 때쯤 배 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배 씨는 "처음에 30대 젊은 학예사들이 찾아와 집 옥상에서 30년째 쓰고 있던 갈대 빗자루를 기증해 달라고 할 때 황당하기도 했고 놀랐다"면서 "나에게 1960년대가 엊그제 같은 기억인데 세상이 바뀌어 갈대 빗자루를 옛 방식 그대로 만드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배 씨는 그 후부터 학예사들과 함께 갈대 빗자루를 만드는 재연 작업을 하고 전승을 위한 강연회와 시연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갈대 빗자루 만들기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한 지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사박물관 추천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제 등록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배씨는 "등록 결과에는 연연치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가 알던 생활상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고, 내가 죽었을 때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더 찾기 어려워진다는 게 안타깝다. 보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