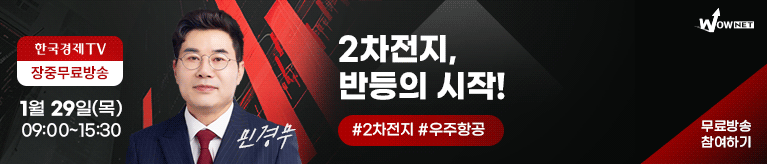국립중앙박물관, '쇠·철·강' 특별전서 유물 730점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평양 석암리 9호분에 출토된 금장식 쇠손칼은 금과 철로 만든 유물이다. 금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노란빛을 띠지만, 철은 산화해 검은빛으로 변했다.
지금이야 철이 일상에서 쓰이는 흔한 금속이지만, 고대에 철은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철을 황금(黃金)에 빗대어 검은색 금이라는 뜻의 '흑금'(黑金)이라 칭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6일부터 선보이는 특별전 '쇠·철·강-철의 문화사'는 인류 문명의 동반자였던 철의 역사를 살피는 자리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1997년 개최된 '철의 역사' 기획전 이후 20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철' 전시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5일 열린 언론공개회에서 "본래는 금과 철을 동시에 다루고자 했는데, 금에 비하면 철은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널리 사용해온 금속이고, 제철 기술의 확립은 인류 문명에서 변곡점이 됐다는 점에서 다룰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전시를 기획한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인류는 처음에 운석에서 철을 채취했다"며 "기원전 2000년께 철을 최초로 제련했던 히타이트가 기원전 1200년 무렵에 멸망하면서 제철 기술이 각지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는 운철을 비롯해 서아시아와 중국, 일본의 유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화재부터 현대 미술품까지 관련 자료 약 730점이 나왔다.
전시는 철의 등장과 전파 과정을 소개한 1부, 철을 권력과 전쟁의 도구로 들여다본 2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된 철제 도구를 통해 철의 효용성을 문화사적으로 풀어낸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거대한 철제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원형 진열장에 유물이 배치됐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품은 다마스쿠스 검이다. 다마스쿠스 검은 인도의 우츠 지방에서 생산되는 강철로 제작됐는데, 연못에 이는 물결과 같은 무늬가 특징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관은 "다마스쿠스 검은 매우 단단해서 유럽에서는 악마가 만든 칼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며 "최근 이뤄진 성분 분석을 통해 우츠의 철에 바나듐이라는 광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철이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은 2부에 있는 경주 황남대총의 덩이쇠를 보면 알 수 있다. 황남대총에서는 3천200여 점의 철기가 출토됐는데, 여기서 나온 덩이쇠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길이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높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당시 덩이쇠는 권력자만 소유할 수 있었던 귀한 재물이었다.

마지막 3부의 백미는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傳) 보원사지 철불이다. 이 철불은 여러 부위별로 주조됐으나, 결합 작업을 매끄럽게 해 주조 흔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넓고 어두운 공간에서 철불에만 은은한 조명을 비춰 엄숙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불상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쉽게 부식되고, 유연하지만 까다로운 철의 모순적인 측면을 정리한 글을 읽어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연계해 10월 13일과 21일 학술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시 종료일은 박물관의 또 다른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과 같은 11월 26일이다.
이후에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동일한 제목으로 전시가 열린다. 관람료는 성인 6천원, 중학생∼대학생 5천원, 초등학생 4천원.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