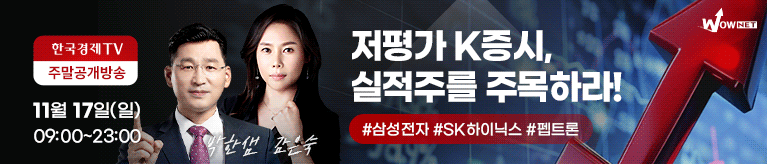신호위반·과속 되는 '긴급자동차'지만 사고 나면 책임져야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환자 살리기냐, 안전운전이냐, 구급대원들이 항상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구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돼 있어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파주읍사거리에서 파주소방서 소속 구급차는 뇌경색으로 인한 70대의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구급차량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1분 1초'가 급했다.
운전자인 파주소방서 소속 A(37)씨는 사거리에 통행 차량이 많지 않자 경광등을 켠 채로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군용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위반 책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완전히 옆으로 넘어지면서 구급차를 운전한 A씨를 포함해 대원 3명과 군용트럭을 운전하던 상사 등 총 4명이 다쳤다. 이송 중이던 환자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고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정상을 참작해주지만 법적 처벌을 면할 순 없다.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소방공무원 B(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2월 저녁 서울 종로구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다 9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상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면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가 처벌을 면제받을 순 없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설 구급차 운전사 C(47)씨가 전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긴급이송 중이더라도 교통사고를 내면 벌칙을 받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되는 등 내부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어졌지만, 아직 형사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대원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하는 임무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이의 딜레마에 항상 놓여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