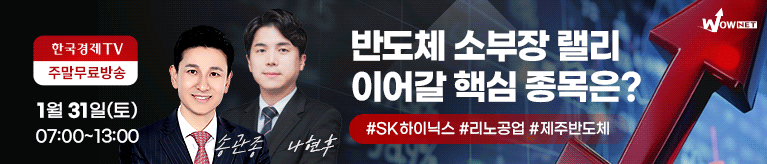허위 광고·무등록 업체 대다수…피해 보상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50대 주부 A씨는 최근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했다.
3년 넘게 일명 '떴다방'에 다니면서 의료 기기를 사들이는 시어머니의 사례를 상담하기 위해서다. 이 떴다방은 판매장을 옮길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바뀐 장소를 알려주고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물건을 환불하려 했지만, 이전 주소로 찾아가 본 매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며 "시어머니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카드나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떴다방 사기가 날로 진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피해 구제 사례를 접수한 고령 소비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떴다방 상술에 속은 피해자가 대다수였다.
상술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186건 가운데 떴다방 상술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원권 20건, 강습회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을 상대로 한 떴다방 등 특설 판매 단속에서 적발한 건수는 전국에서 20건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하반기에 걸쳐 합동이나 개별 단속을 하지만 떴다방은 다양하게 변종 영업을 하며 기승을 부린다.
59세 이하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59 매장', 60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때깔 매장', 하루∼보름 사이에만 잠깐 운영하는 '단타방' 등 방식도 다양하다.
정윤선 울산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1∼2개월 동안 잠깐 무등록 영업을 하다가 바로 없어지는 떴다방은 지자체도 뾰족한 단속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워 자체 신고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떴다방은 주로 과대광고를 하며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상조 관련 상품, 가전제품 등을 파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떴다방에서 흔히 하는 제품 설명회, 홍보, 판촉 활동 등 구두로 속이는 경우는 법률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대다수의 떴다방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계약 해지가 어렵다. 영수증이나 계약서조차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2014년 9월∼2015년 8월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 드러난 업체 70개 가운데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폐업한 업체는 58.6%에 달했다.
정 사무국장은 "피해 노인들이 뒤늦게 대처하려고 해도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떴다방은 단속이 어려운 만큼 노인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과 사전 신고 활성화만이 유일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