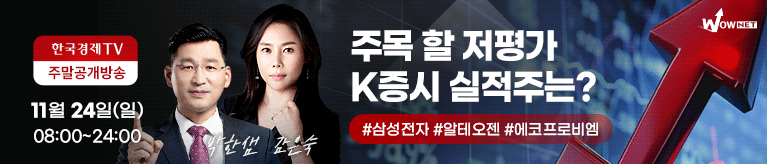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전립선암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전립선 특이항원(PSA: prostate-specific antigen)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D등급)에서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C등급)로 한 단계 내리는 지침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AP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특위는 2012년 연령에 상관없이 PSA 검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해 환자와 의사의 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미국 비뇨기과학회(AUC)와 미국 암학회(ACS)와 정면 충돌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 지침을 AUA와 ACS의 입장에 가깝게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양측 간에 이견이 있다. 특위는 환자와 의사의 상의를 55세에서 69세까지로 한정했다. 55세 이전과 69세 이후는 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UA와 ACS는 55세 이전부터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의 2012년 지침은 4등급, 이번에 수정한 지침은 3등급에 해당한다.
USPSTF의 지침에는 A, B, C, D의 4등급이 있다.
A등급은 효과가 상당한 것이 확실하고 B등급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다. C등급은 징후나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아주 적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D등급은 효과가 없거나 득보다는 실이 커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수정 지침은 초안으로 5월 8일까지 공개토론에 부친 다음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PSA는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립선암이 아닌 전립선비대, 전립선염 등 다른 양성 질환인 경우에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 허위양성 위험이 있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대체로 암인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가 시행되고 암이 확인되면 전립선 절제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시작된다. 이에는 요실금, 성 불능 등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
암이 확인된 환자도 대개는 진행이 느려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암이 확인돼도 주기적으로 PSA 검사와 조직검사를 계속하면서 암이 치료할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적극적 추적관찰'(active surveillance)이나 주기적 검사 없이 단순히 증상이 나타나는지만을 살피는 '관찰대기'(watchful waiting)를 하기도 한다.
질병예방특위의 키르스텐 비빈스-도밍고 의장은 2012년 당시에는 PSA 검사의 득과 실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PSA 검사로 전립선암 사망 위험이 "아주 약간"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침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5~69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PSA 검사의 득과 실을 최장 15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PSA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는 1천 명 당 24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명이 조직검사도 양성으로 나왔다. 이 100명 중 80명은 전립선 절제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65명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15명은 일정 기간 '적극적 추적관찰' 후 치료를 시작했다.
적극적인 치료를 택한 80명 중 60명이 요실금, 성 불능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직검사 양성 환자 100명 가운데 20~50%는 암이 전혀 자라지 않고 전이되지 않거나 해로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PSA 검사를 했더라면 전이성 전립선암을 막을 수 있었을 확률은 1천 명에 3명,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을 확률은 1천 명에 1~2명으로 분석됐다.
USPSTF는 독립기관이지만 미국 보건후생부가 선정한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특위가 발표하는 지침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s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