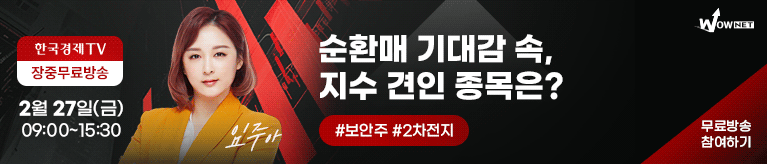베이징 중단·호주 대형 발전소 폐쇄…EU도 축소 불가피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가 지구온난화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등 일부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여전히 관심이 많지만,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퇴조세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요 석탄발전소인 헤이즐우드(Hazelwood) 발전소는 24일부터 29일까지 단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된다.
발전용량이 1천600㎿인 이 발전소는 50년 이상 가동되면서 빅토리아주 발전량의 22%를, 호주 전체로는 5%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함께 빅토리아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며 눈총을 받아왔고, 운영업체는 더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 아래 문을 닫기로 했다.
호주 정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발전량의 63%를 석탄이 차지한다. 하지만 호주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석탄발전소가 주범이라는 인식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겨냥한 압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스모그를 연상시키는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근 석탄발전소가 모두 사라졌다.
화넝(華能) 열병합발전소는 5대의 석탄 발전기 중 마지막 발전기 가동을 지난 17일 중단했고, 이에 따라 베이징시 관할 석탄발전소 4곳 모두 가동이 멈췄다.
석탄발전소는 모두 사라졌지만, 베이징시는 전력 수요를 인접 지역 석탄발전소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이른 시일 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심각한 스모그를 이유로 건설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103개의 건설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약 300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유럽연합(EU)에서도 화력발전소의 미래는 점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 연구기관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기후협정하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을 맞추려면 EU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내놓기도 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유럽에 신설될 전력망의 90%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온난화 방지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까지 세계 석탄 발전량을 20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의 비중이 줄면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력이 관심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는 부족한 전력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수력발전 시설을 활용하겠다며 지난 16일 최대 20억 호주달러(1조7천억원)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석탄을 '청정연료'로 재분류, 저공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반대파를 의식한 듯 수력발전 쪽에 힘을 실었다.
유럽에서도 최근 수력 에너지의 비중은 석탄을 추월, 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전력원이 됐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성을 앞세워 여전히 석탄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뒤 원전 가동 전면 중지 및 전력 자유화 정책으로 효율은 높이고 탄소배출은 낮췄다는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이달 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지바(千葉)에 건설하려던 석탄발전소 계획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석연료업계와 유착 의혹을 받는 인물을 환경보호청장에 임명하는 등 일부 국가의 보수정부들이 지구온난화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석탄발전소 축소 추세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