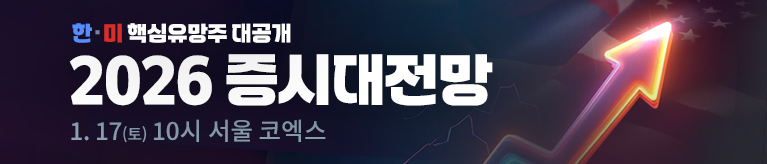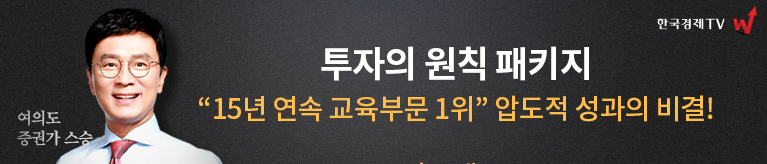<앵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민간 중심의 자본시장 기반 모델이 정책 설계의 핵심 축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퇴임 후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하며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은행 단일 주체가 아닌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이 발행자로 참여하는 분산형 구조입니다.
준비자산도 단순 현금이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토큰의 발행·소각·상환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처리되며, 실시간 준비금 공시와 감사 등을 구현해 구조적 신뢰를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 실장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테더(USDT)와 서클(USDC) 역시 이와 같은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 5월 발표한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은행 단일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산운용사와 핀테크, 커스터디사 등이 참여하는 분산 구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도 결을 같이합니다.
[강형구 / 한양대학교 교수 :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고 산업의 추세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거 같고,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겠죠. 그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부 기구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거고요.]
정부는 시장 유연성과 기술 기반의 정책 설계를 예고했고, 국회는 이에 발맞춰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시장 질서는 정비하되 민간의 혁신은 제약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정책과 입법 양측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금,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이성근, 영상편집 : 권슬기, CG : 김민송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