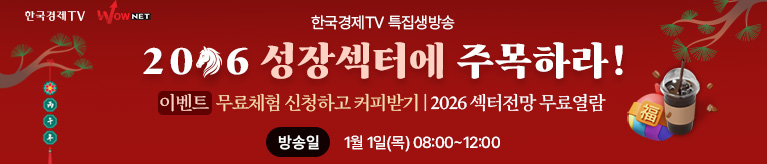<앵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차주들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는데요.
정작 현장에선 대출금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정금리형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대출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행정지도안입니다.
올해 말까지 은행권은 순수 고정금리형과 주기형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이를 만족하는 비중은 약 18%.
앞으로 12% 가량, 대출 잔액으로 보면 약 50조원 가량을 고정금리형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차주들의 선택권 제한과 더불어 자칫 변동금리형과 혼합금리형 대출금리가 오르는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은행권에서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비중 조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형 비중 확대가 차주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볼 부분인데,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정금리대출이 많이 취급되는 국가에서 다양한 단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기침체 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차주들로 하여금 경기변동으로 하여금 대응력을 주지만…]
고정금리형의 경우 기준금리가 오르내려도 기존 차주들의 대출 총상환금액에는 변화가 없다보니, 통화정책이 내수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금리형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질 않아 금리인상기에도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주택시장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고정금리형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일 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은행에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는 입장.
대출상품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정금리형을 만능 해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