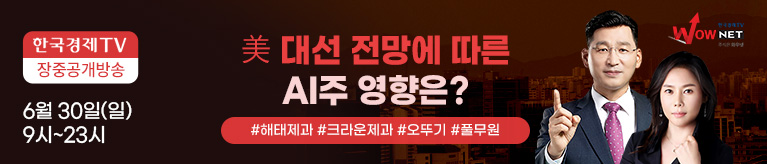<앵커>
20여년 넘게 5천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고객들이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고객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국내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예금보험공사도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지난 3월 제도개편을 위한 TF를 출범한 데 이어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은 저축은행으로 크게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타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건전성 우려 문제로 그동안 저축은행에 투자하기를 망설여왔던 금융소비자들이 많았던 데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쪼개 돈을 집어넣었던 예금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권의 예적금 평균금리는 연 3%대로, 시중은행보다 현재 약 1%p가량 더 높습니다.
다만, 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확대 우려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 이 부담이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인상, 예적금금리 인하 등의 형태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회사든, 소비자든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을 져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적정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예보료율은 낮게는 0.08%에서 높게는 0.4%로 금융업권별로 차등 부담하고 있는 상황.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각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 상한선은 어디까지인지, 또 한도를 한번에 올릴지 나눠서 올릴지 등 여러 요소들을 따져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뉴스